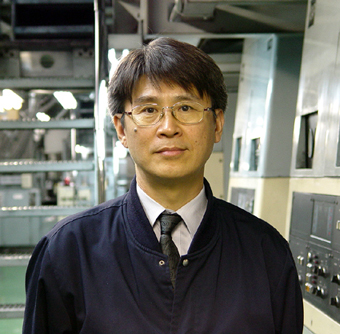1972년 인쇄실습 첫 인연
특종 했을땐 자기 일처럼 신명
“사람들이 신문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볼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데... 존경받을 수 있는 기자,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76년부터 28년 동안 신문을 인쇄했다. 활판기에서부터 옵셋 CTS까지 신문은 그가 걸어온 인생의 전부다. 이러하기에 신문의 날을 맞는 그의 느낌은 남다르다.
동아일보 윤전부 이천규 부장. 이 부장이 신문인쇄에 첫발을 담근 때는 1972년. 고등학생이었던 그가 광화문 동아일보로 인쇄 실습을 나간 것이 계기였다.
이 부장은 “신문 배달은 해봤어도 신문을 인쇄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었다”며 “잉크가 몸에 쏟아져 온 몸이 까맣게 물든 적이 많았고 잉크 때문에 눈자위가 까맣게 변해 퇴근 후 데이트 나가면 무슨 광대라도 본 듯 사람들이 쳐다봐서 창피한 적이 많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인쇄상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쇄 탓만 할 때 아무 말 못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이 부장은 “신문을 인쇄한다는 것은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들이 완성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신문 인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기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격동의 시절’에 대한 기억도 있다. “80년 광주민주화항쟁 당시는 신문을 인쇄하기 직전 몇몇 기사들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사가 삭제되고 공백으로 나간 신문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인쇄가 산뜻하게 잘 되었을 때는 항상 그렇다”며 “때로는 견학을 온 아이들이 내 설명을 듣고 감탄할 때와 가끔씩 오랜 독자라며 전화를 걸어 인쇄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말해줄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문에 실린 내용 때문에 여기저기서 오해받을 때는 종사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특종하면 신이 난다”며 “인쇄하는 사람도 기자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어릴 적에 신문에 뭔가가 났다하면 백과사전인 양 무조건 믿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확하고 공정한 시각에서 몇 번이고 확인해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런 충고를 하기도 했다.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