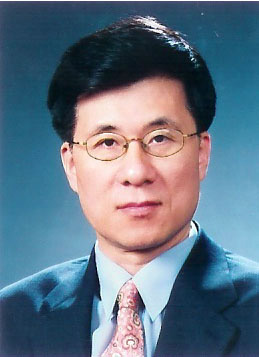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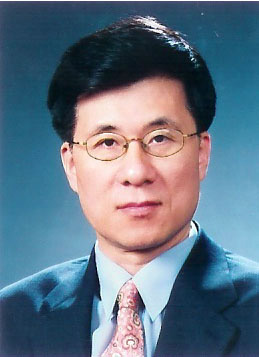 |
|
| |
| |
▲ 신경민 MBC 보도국 부국장 |
|
| |
38편중 10편만 1차 통과…풍요속 빈곤 절감
본격적 가을인 이 달에는 풍성 속에 빈곤함을 느꼈다. 8개 부문에 모두 38편이 출품됐으나 10편만이 1차 심사를 통과했고 우수작이 아예 없거나 부득이 추천을 한 부문도 있었다.
취재 보도에서 문화일보의 ‘국정원 경제단 비리’를 선정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기사 요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정원이라는 특별하고 내밀한 대상을 취재할 때 이런 요건을 고집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변호가 동의를 얻어냈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내용을 전폭 시인하는 징계를 내린 점도 참작됐다. 파편을 짜깁기하기 위해 고생한 취재기자의 노력과 함께 취재와 편집 과정에서 용기를 넣어줬을 것으로 짐작되는 편집진들에게 치하의 일부를 보낸다. 이데일리의 ‘청와대 직원, 기업에 행사비 압력 의혹’에 대해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탈락시키는데 아쉬움을 보이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취재가 비교적 단순했고 요즘 청와대 비판기사에서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선정된 두 시리즈는 모두 수작이었다. 세계일보의 탈북자 시리즈는 그동안 탈북 과정에만 천착해온 정부나 언론의 시각을 교정시키고 심각해져 가는 정착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다는 일치된 평을 들었다. 아무래도 접근이 쉽지 않은 탈북자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 조사 기법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동아일보가 기획한 ‘동화은행 퇴출 그 후 6년’ 시리즈는 퇴출된 은행의 옛 직원들을 개별 접근해서 거시 통계에 숨겨진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새로운 접근이었다. 이 기획이 내린 결론은 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결론으로 제시된 숫자는 현실에 살아 있어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방송부문의 ‘피고 대한민국…’에서는 소재의 신선함과 급박함보다는 제작진의 성실한 노력이 돋보였다. 상당히 길게 취급된 친일파 소유 부동산 문제보다는 국유지 반환 소송에서 오랜 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 지적이 훨씬 심각한 문제로 판단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 ‘광주시 교육위 담합각서’는 오래된 교육계 의혹을 직접 눈앞에 보여준 수작이었다. 전남일보 기자의 끈질긴 노력의 소산이었고 이것이 위원회 개편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끌어낸 계기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대전 MBC의 ‘뼈주사, 이대로는 안된다’는 지역이슈를 전국화한 대표 사례로서 노인들의 무지를 이용해 건강을 버리면서 돈벌이를 하는 실태가 잘 표현됐다.
지역 기획보도 부문의 ‘돈돈돈…땅땅땅’에서는 경인일보의 고발성과 문제의식이 잘 드러났고 현장을 열심히 뛴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불패신화’ ‘남부 접수’등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묘사한 단어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상이 그렇지 않느냐는 변론도 동시에 나왔다.
‘안상수 시장의 굴비상자 사건’ 기사와 관련해 심사위원들은 논의 끝에 한 언론의 특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출품작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위를 알아 본 결과 한 언론이 먼저 취재에 착수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 직후 인천 시청이 이를 해명하고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언론이 같은 시점에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종 보도에 대한 기본 기준에 속하는 만큼 심사위원들은 출품한 회사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