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가게에서 배우는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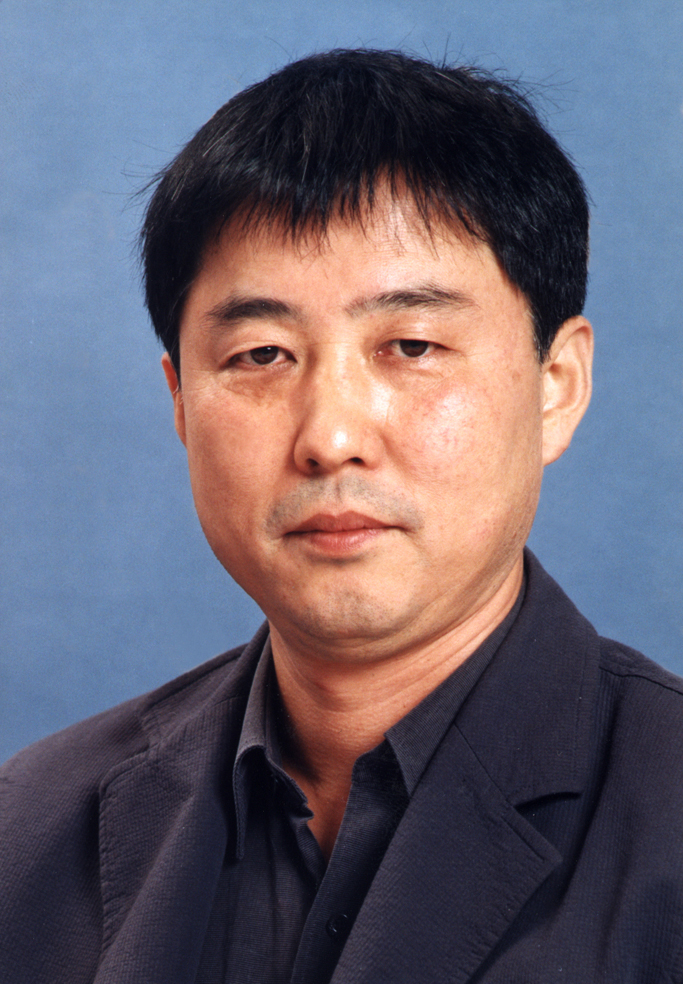 |
||
| ▲ 김영욱 위원 | ||
한국 신문은 다르다. 힘들게 생산한 물건을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남에게 헐값에 넘기고 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그 ‘남’이 자신의 경쟁자라는 사실이다. 종합일간지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기사를 제공하고 받는 돈이 월 3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자 한명에서 서너 명 인건비에 불과하다. 수 백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만든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다. 신문사가 포털에 기사를 파는 것은 뉴스라는 상품이 가진 비경합성에서 오는 착시 현상 때문일 것이다. 생선과 달리, 뉴스는 한 번 소비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다른 곳에 제공한 기사도 다음날 아침 다시 포장해서 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뉴스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다. 한 번 ‘소비’한 사람이 같은 뉴스를 다시 소비하지 않는다. 뉴스는 또한 신선도가 생명이다. 신문에서 속보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최초 보도’가 갖는 상품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한국 신문이 생산한 뉴스는 독자에게 오기 전에 곳곳에서 새고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뿐만 아니다. 자사 인터넷 사이트의 뉴스 제공도 그렇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용자가 유난히 많은 한국에서 이 서비스는 종이 신문에 치명적이다. 한국 신문의 기사 양이나 정보 밀도가 종이가 아니면 읽기 힘든 정도가 아니다. 가판도 누수가 발생하는 곳이다. 방송사 메인 뉴스에서 신문 가판은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지만, 정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압이 낮아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맥 빠진 물줄기처럼 아침 신문을 펼칠 때의 긴장감은 사라져 버렸다. 이와 함께 돈 주고 신문을 구독할 필요성도 없어지고 있다.
포털 뉴스나 인터넷을 통한 뉴스 제공이 내포하고 있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널리즘이 설 땅을 허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볍고 흥미있는 기사에 길들여진 독자가 진지한 저널리즘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 신문은 기사의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시급하다. 자신이 걸터앉은 나무의 밑통을 톱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신문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노력에는 연합뉴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합은 포탈과 무료신문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으로서는 수입원 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널리즘이 무너지면 뉴스통신사의 존재 가치도 줄어든다. 연합의 주주는 언론사다. 신문사가 소유한 지분이 25%로 방송 75%에 비하면 적지만, 미미한 비율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사들이 주주로서의 의무와 권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신문이 연합을 경쟁자 혹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