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에 국제 경제·증시 소식 배달합니다"
[미디어 뉴 웨이브]
글로벌뉴스 1인 미디어 '뉴스포터'

해리포터를 만나려면 런던 킹스크로스역 9와 3/4 플랫폼에서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야 한다. 그 ‘마법의 벽’을 통과할 수 있다면 말이다. ‘혜리’포터를 만나는 방법은 더 간단하다. 스마트폰을 켜고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된다. 이메일함을 뒤질 필요도, 긴 호흡의 글을 읽기 위해 마음먹고 시간을 낼 필요도 없다. 하루 24시간, 주 7일 국제뉴스를 짐꾼(포터)처럼 실어나르는 혜리포터가 그곳에 있다. 물론 돈을 내고 가입 승인을 받은 구독자에게만 허락되는 문이지만.

글로벌뉴스 1인 미디어를 표방하는 뉴스포터는 신혜리 기자가 2020년 4월 런칭한 독립 미디어이자 플랫폼이며, 커뮤니티다. 페이스북 기반의 유료 채널로 시작해 지난해 말부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혜리포터+X’)와 카카오뷰 등으로 채널을 확장했다. 국제경제 뉴스 큐레이션을 기본으로 미국 증시와 기업 분석, 내·외신 경제기사 팩트체크 등을 하고 있다.

뉴스포터 대표인 신혜리 기자는 스스로를 ‘뱅커’ ‘저널리스트’ ‘헤비(heavy) 페부커(facebooker)’ 등의 키워드로 설명한다. 캐나다 교포인 그는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에서 7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 그 사이 밴쿠버에서 뱅커(은행원)로도 일했다. “깊이 있는 국제경제 기사”를 쓰고 싶어 브런치와 페이스북에 열심히 글을 올리다 2년 전 아예 페이스북에 유료 채널을 만들었다. 미국 주식 열풍으로 ‘서학개미’란 용어가 막 생겨나던 때였다. “월 100만원”이라는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구독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두 달 뒤면 2주년을 맞는 뉴스포터의 현재 유료 구독자는 330여명. 월 2만원 정도의 다소 비싼 구독료에도 유료 구독자 300~4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속에서도 ‘광고 없는 1인 독립미디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순항 중인 셈이다. 가입 신청이 많을 때면 하루에 5~60명에 이르기도 하니, 구독자를 확 늘리는 것도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신 기자는 “지금이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뉴스포터 채널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가입 승인 절차를 통해 비교적 깐깐하게 “독자를 고르는” 것도 그래서다. 그에게는 당장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뉴스포터라는 ‘커뮤니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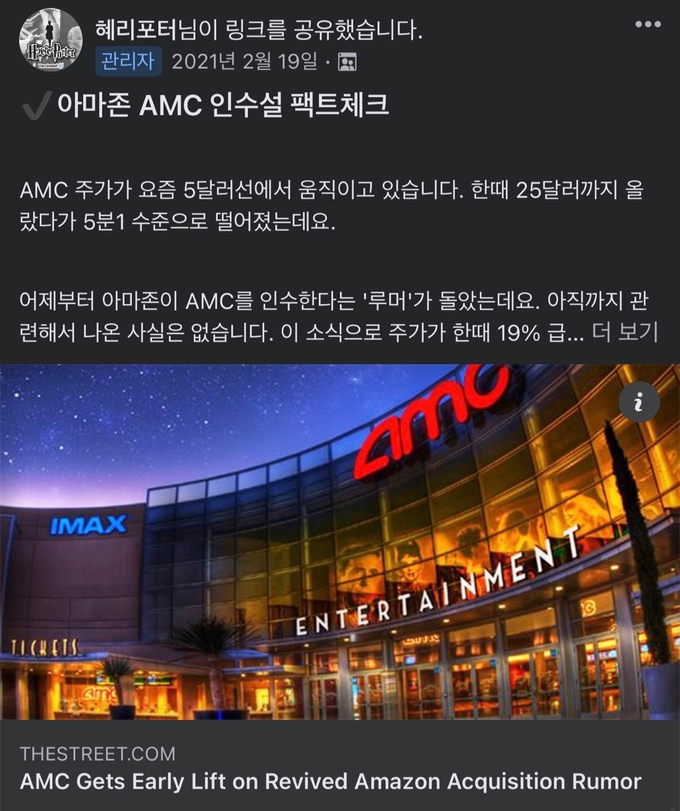
‘커뮤니티 플러스 플랫폼’. 그가 말하는 뉴스포터의 정의다. 그는 뉴스포터를 “커뮤니티형 플랫폼 미디어”로 만들고 싶다. 뉴스포터는 그가 대표부터 기사 작성, 회계까지 겸하는 1인 미디어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해외 각국에서 외신 정보를 큐레이션 해주는 통신원들이 있고, 그래픽 등의 일을 도와주는 동료가 있다. 모두가 그의 독자다. 신 기자가 글의 80을 쓴다면 독자가 20을 쓴다. 그는 “자신과 독자가 함께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친밀감과 교류”를 중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뉴스포터 독자는 기업 총수나 고위 임원, 의사, 목수, 주부 등 직업은 물론, 연령대도 다양하다. ‘미국 주식 투자’라는 공통의 관심사 아래 뉴스포터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기획 강연이나 ‘번개’ 모임 등을 통해 만나고, 서로가 사업의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이 커뮤니티에 있으면 평소에 못 만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지식도, 사업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콘텐츠를 큐레이션 하기도 하지만 인간관계도 필터링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거죠.”
얼마 전엔 미국 챔피언 바리스타를 초청해 브루잉 클래스를 열었는데, 참가비 3만원을 받아 그 이상의 선물로 돌려줬다. 이제껏 구독료 외의 방법으로 돈 벌 궁리는 안 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수익을 다각화해볼 참이다. 독자들과의 캐나다 투어나 영어캠프, 친환경 제품 등과의 콜라보나 구독+강연 패키지 상품 등을 고민 중이다. “항상 고민이긴 해요. 제가 더 키워서 직원도 뽑고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페이스북에 ‘구독’ ‘결제’ 버튼만 만들어져도 지금보다 더 키울 자신이 있는데 말이죠. 하하.”
뉴스포터가 처음 런칭할 때에 비해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해외 증시 등 글로벌경제 콘텐츠가 주요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신 기자는 “저 혼자 하는 콘텐츠를 일간지나 경제지에선 10명이 한다”며 “1인 미디어로서 콘텐츠로 싸우는 건 힘들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일상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다. 구독자의 일상에 네트워킹을 제공하거나 소소한 모임 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가 하는 “필터링 없는 뉴스” 외신 클리핑을 두고 한 독자는 “1인 비서를 월 2만원에 쓰는 셈”이라고 했다. 그에겐 “광고주가 아닌 독자를 알고 만나는 게 삶의 최우선”이다. “전 기자잖아요. 전문가라고 할 순 없어요. 미국 증시 흐름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사람으로서 흐름을 설명할 순 있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죠. 저는 말 그대로 ‘포터’예요. 외신이나 해외 반응, 시장 흐름 등을 그대로 왜곡 없이 안전하게 독자의 손까지 전달해주는 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