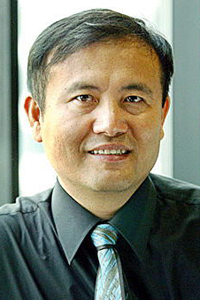한식의 세계화를 빠르게 하려면
한국기자협회 온라인칼럼 [박태균의 식약파일]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webmaster@journalist.or.kr | 입력
2011.05.07 14:58:5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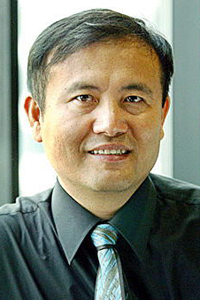 |
|
| |
| |
▲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
|
| |
언론인과 소비자가 음식업을 외식산업인정해야
한반도 음식점의 역사는 주막(酒幕)에서 시작된다. 주막의 기원을 신라시대 김유신이 어릴 때 다니던 술집 천관(天官)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기록상 처음 주막이 생긴 것은 고려 성종 2년 때다. 해외교역이 활발했던 고려의 수도 개성엔 외국 상인들을 위한 영빈관ㆍ회선관 등이 세워졌고 여기서 자연스레 술과 음식을 팔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촌 사회가 중심이던 조선시대엔 TV 사극 드라마에서처럼 ‘마을의 온갖 정보들이 소통되던’ 주막은 드물었다. 조선 후기인 18세기에 와서야 주막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당시 시골의 시장가엔 주막이 3분이 1을 차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주막은 한자의 뜻대로 작은 술집이다. 술을 마시고 안주로 요기를 하며 잠도 잘 수 있는 곳이었다. 술값ㆍ음식 값은 받지만 숙박비는 따로 지불하지 않아 숙박업소라기보다는 주점에 더 가까웠다. 음식을 주문하면 김치 등 반찬값은 받지 않는 국내 식당들의 오랜 전통도 주막의 기억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속학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영하 교수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음식점의 탄생이 늦어진 것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상업적 기능을 가진 도시가 한양(서울)ㆍ송도(개성)ㆍ평양ㆍ전주ㆍ대구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양한 형태주점은 19세기 등장
19세기 말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주점들이 문을 연다.
몰락한 양반가의 부인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차린 내외주점, 막걸리를 사발로 파는 사발막걸릿집, 서서 술을 마시는 목로주점, 술 찌꺼기를 걸러 만든 모주를 파는 모줏집, 기생이 나오는 색주가 등이다.
주점 일부가 전문 밥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기 시작한 것은 1930대부터다. 술을 마신 손님들이 국물이 있는 탕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한정식을 제공한 최초의 전문 음식점(요릿집)은 궁중요리를 하던 안순환이 1909년에 세운 명월관이다. 명월관은 기생집을 겸했다. 한상 가득 차린 교자상엔 ‘승기악탕’ㆍ‘신선로’ 등 궁중음식이 주로 올랐다. 명월관의 교자상은 밖으로 배달까지 돼 한식 출장 뷔페의 효시로 알려졌다.
해방ㆍ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요릿집 대신 요정이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에 요정은 한정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탈바꿈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음식점은 주막→주점→주점을 겸한 밥집→요릿집→요정 등 오랫동안 술이 주 메뉴였다. 기생 등의 접대를 받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일본 강점기에도 위생을 관리해야 할 대상(조선총독부의 음식점ㆍ요리옥 관리법)으로 간주됐다.
| |
 |
|
| |
| |
▲ 지난해 5월 24일(현지시간)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2010 국제외식산업박람회(NRA) '한식 홍보관'을 찾은 요리전문 인터넷 매거진 '스타쉐프(StarChefs.com)'의 CEO 앙트와네트 브루노는 "아이 러브 비빔밥!"을 외치며 "한국음식은 맛과 향이 최고인 음식"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합뉴스) |
|
| |
물장사 술장사 폄하된 음식점 80년대 외식산업성장
이 같은 뿌리 탓에 물장사ㆍ술장사 등으로 폄하되던 음식점은 1980년대 이후 국가의 중요한 산업(외식산업)으로 성장했다. 2009년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약 70조원으로 IT 산업의 1.3배에 달한다(통계청). 종사자수는 2백50만 명을 넘어 국가 전체 고용의 8.2%를 차지한다.
전국의 식당 수는 57만6천9백90곳(2009년)으로 인구 86명당 1곳 꼴이다. 인구당 식당수가 일본(1백70명당 1곳)ㆍ미국(3백22명당 1곳)ㆍ중국(2백24명당 1곳)을 뛰어넘는 ‘외식 왕국’으로 발돋움했다.
굳이 통계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이 밀접한 곳에선 식당이 한집 건너 있을 정도다. ‘먹자골목’ㆍ‘음식점 전문 건물’이 생기고 퇴직 후 가장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한국음식업중앙회 명칭 ‘신경전’
이처럼 몸집이 커진 외식산업이 용어 하나를 놓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명칭을 외식산업중앙회로 변경해달라고 복지부에 신청했지만 ‘허용 불가’라는 벽에 부딪친 것이다.
국내에서 외식산업이란 용어는 1979년 10월 일본 롯데리아의 국내 상륙 때 처음 사용됐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음식업은 밥장사ㆍ물장사ㆍ식당업으로 지칭돼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음식업중앙회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휴게음식점ㆍ집단급식소 등이 있는데 (일반)음식업만 외식산업이냐”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상관없이 우리 언론인과 소비자가 먼저 음식업을 외식산업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주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이 선호하는 용어로 불러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외식업계 종사자의 자존감ㆍ자부심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의 질이 높아지고 안전해지며 한식의 세계화도 빨라질 것이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