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관, 미국 경찰관
[스페셜리스트│외교·통일] 이하원 조선일보 기자·외교안보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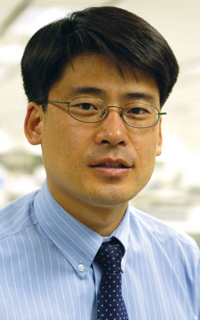 |
||
| ▲ 이하원 조선일보 기자 | ||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심리적 이유 때문일까. 목 주변의 통증이 심해졌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다. 경찰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185㎝를 훌쩍 넘는 키의 미국 경찰관이 다가왔다. 앞뒤로 오가며 사고 상황을 살펴봤다. 내 설명도 들었다. 그런 후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 서로 인적사항을 교환토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내게 건네줬다. “혹시라도 사고 처리가 잘되지 않으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미국인 운전자는 경찰관 판정에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 후 자동차 수리비를 수표로 보내왔다.
또 다른 모습의 미국 경찰관도 경험했다. 서울에서 지인(知人)이 방문했을 때다. 버지니아주의 간선 도로인 4차로의 123번 도로를 달렸다. 목적지에 가까이 왔을 때다. 갑자기 앞에 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 이어서 유턴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로를 막아선 경찰관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우회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니 전면 통제할 상황은 아니었다. 반대 차선의 1차로를 활용할 경우 통행이 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관은 다른 길을 찾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을 따르면 15분 이상 돌아가야만 했다. 미국인 운전자 중에서 이 조치에 항의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기자만이 경찰관에게 쏘아붙였다.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우회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국식’으로 짜증을 내자 미국 경찰관이 신기한 듯 쳐다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미국 경찰관의 친절함과 단호함. 그리고 이들의 명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절대적인 준수(遵守)는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에 거주했거나 여행을 다녀 온 이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례다.
얼마 전 한국의 TV는 이와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진 한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경남 진주에 사는 40대 중장비 기사는 경찰수사에 앙심을 품었다. 그는 만취한 후 자신의 굴삭기를 몰고 지구대(파출소)를 습격했다. CCTV 영상에 담긴 ‘지구대 습격사건’은 해외토픽감이었다. 그는 굴삭기 집게로 지구대 경계석을 뽑아버렸다. 순찰차를 집어서 벽을 향해 던지는 장면도 있었다. 지구대가 아수라장이 된 것은 물론 경찰관들은 사선(死線)에 선 것 같은 위협을 느껴야 했다. 중장비 기사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기자는 공권력에 ‘무한도전’한 이 사건이 최소한 며칠을 끌 줄 알았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보도가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냥 ‘단발성, 화제성 기사’로 끝나버렸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경찰이 두들겨맞거나 무시당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과격해진 촛불집회 현장에서 일부 시위대에 무장해제당하고 얻어맞았다. 유명 프로야구선수가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뒤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우리 경찰이 평소 선진국처럼 높은 대민(對民) 서비스로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경찰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침묵하던 많은 시민들이 “법 집행하는 경찰관, 전경 때리지 말라”고 나서지 않을까. 경찰로 대표되는 한국의 공권력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위상을 높일지에 대한 숙고(熟考)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