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나리오' 장사하는 미 한반도 전문가들
[글로벌 리포트│미국] 이태규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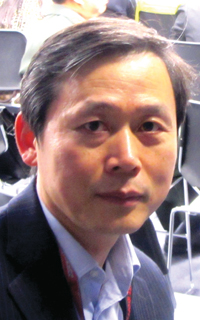 |
||
| ▲ 이태규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주한 미국대사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출신, 싱크탱크 연구원, 교수를 포함해 1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반도 현안에 부응해 움직이는 전문가들은 20~30여 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중국 또는 일본을 연구하면서 부전공으로 한국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상당수다. 한반도 전문가들의 인력 풀이 두텁지 않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살펴볼 사례가 최근 발견됐다.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 17일 ‘빅벳 그리고 블랙 스완’이란 제목의 외교정책 제안서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춘 제안서는 20개 주제를 빅벳(대도박)과 블랙 스완(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나눠 시나리오와 대책을 다뤘는데, 브루킹스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중국센터 소장 대행인 조나단 폴락은 블랙 스완의 하나로서 ‘한반도 충돌(Confrontation over Korea)’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로 인한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선 서로 북한에 투입될 군의 정보를 공개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핵무기와 핵 물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개 계획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13만 미국인과 65만 중국인을 한·중 간을 오가는 하루 200여 편의 여객기와 대형 여객선을 이용해 소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며 든 생각 중 하나는 한반도 정세가 한국을 제외시킨 채 흘러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특이점은 다른 데 있다. 미·중의 한반도 충돌의 전제 조건인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 이유를 추적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폴락의 보고서는 가까이는 지난해 8월 미국 랜드연구소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급변설의 오류를 범했던 랜드연구소는 북한붕괴로 인한 미중 전쟁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협의를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폴락의 보고서는 또 멀리는 1990년대 워싱턴의 북한 급변사태 전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딕 체니는 국방장관 당시 중국을 방문해 북한 붕괴 문제를 협의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신보수주의자(네오콘)가 득세한 2000년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 붕괴론은 정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하며 버텨냈고 김정일 사후에도 급변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 급변설을 유지하되 브루킹스 보고서가 그랬듯 ‘북한붕괴 임박’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20년 넘게 동일한 북한 급변 전망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양치기 소년’이 된 때문이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이 되면서까지 급변설을 수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보수적인 전문가들에게 ‘장사’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폴락은 보고서의 결론에서 지난 2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불안 문제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고, 북한의 해체는 더 이상 가정적 가능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내내 북한 붕괴설에 매달렸던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불임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시나리오는 현실과는 다르기 마련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서구적 시각에 따라 불안정의 지표만 골라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면 오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발간된 지 35년 된 ‘오리엔탈리즘’이 이미 정리한 대로 서양인들의 동양에 대한 선입관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국제외교에서 워싱턴의 독보적 위상을 감안할 때 이들의 잘못되고 어설픈 견해로 인해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그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가 어려울수록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주워담기보다는 이들의 생각을 검증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