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해트트릭이 가져올 변화는
[글로벌 리포트 | 미국] 이태규 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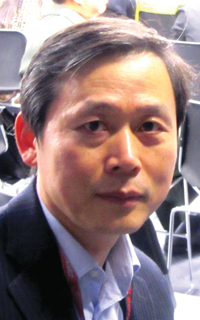 |
||
| ▲ 이태규 한국일보 워싱턴특파원 | ||
그로부터 10년이 안 된 지금 미국은 상전벽해와 같은 에너지 붐을 맞고 있다. 책 ‘부의 제국’으로 알려진 금융역사학자 존 스틸 고든은 에너지 칼럼에서 종종 ‘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맞춰보라’며 의기양양해 한다. 실제로 원유, 가스 등을 포함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은 어느 나라일까.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2년 11월에 미국이 두 나라를 추월했다. 환경문제로 에너지 개발에 소극적인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다. 2016년에는 원유만 따져도 사우디와 거의 같은 하루 생산량이 1000만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EIA는 내다보고 있다.
원유뿐만이 아니라 셰일가스 개발 붐에 힘입은 천연가스의 생산은 2012년 이후 2040년까지 56%가 더 늘어나 해외 수출처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이 사우디의 원유생산을 추월하는 시점이 이보다 이른 2015년이 되며, 2035년에는 북미 지역에서 원유 수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정치, 경제 부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원유수출 허용 문제다. 에너지가 부족했던 미국은 에너지 수출 시 국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에너지정책보호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0일 하루만 해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카토연구소가 각각 세미나를 열어 원유 수출금지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했다.
사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진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분야다.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3가지 효과가 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예상치 못한 ‘해트 트릭’이다. 하지만 미국이 에너지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바뀌는 것이 세계질서에 어떤 변화를 줄지 아직은 가늠키 어렵다.
일례로 클린 에너지로 불리는 천연가스 개발 덕에 미국의 204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자 조지 W 부시 정부 때 기후변화 이슈에 방어만 하던 미국은 오히려 기후변화를 적극적 외교수단으로 삼아 다른 나라를 압박한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외교칼럼을 쓰는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최근 “미국의 오래된 에너지 비관주의에 구멍이 뚫렸다”며 “우리는 에너지 독립과 중동 소요에 휘말려들 위험의 감소가 뜻하는 전략적 의미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고 은근히 과시했다.
미국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해외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처 확보가 주요 안보 문제였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 원유를 차지하기 위해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이 나서 “미국이 중동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아이디어는 잘못됐다”고 중동권을 진정시키는 모습은 얼마 전까지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사우디 경우만 해도 2002년 제임스 울시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은 미국이 중동 원유 특히 사우디의 원유에 의존해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이란, 시리아 문제에서 더 이상 사우디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고, 그래서 사우디는 원유 거래에서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에너지 수출이 정부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 공급을 놓고 유럽연합(EU) 등을 압박하기도 했으나, 앞으로 새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할 상황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 아시아로 이동하는 사이 중국은 중동으로 달려가고, 러시아는 아시아 시장을 넘보는 형국이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질서에 편승해 있던 한국의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