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자유의 나라
[글로벌 리포트 | 미국] 손제민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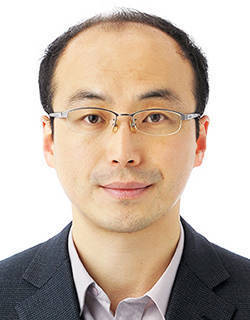 어느 날 밤 펜타곤 근처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헤매던 중 뒤에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를 쫓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디선가 들은 대로 오른쪽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에 두 손을 가만히 얹고 있었다. 1분쯤 지났을까. 경찰관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왔다.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얹은 채. 정지신호를 위반했다며 면허증을 요구했다. 경찰은 전과조회 결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며 경고장만 발부하고 놓아줬다. 그 때는 안도했지만, 요즘도 가끔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그 권총이 생각난다.
어느 날 밤 펜타곤 근처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헤매던 중 뒤에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를 쫓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디선가 들은 대로 오른쪽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에 두 손을 가만히 얹고 있었다. 1분쯤 지났을까. 경찰관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왔다.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얹은 채. 정지신호를 위반했다며 면허증을 요구했다. 경찰은 전과조회 결과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며 경고장만 발부하고 놓아줬다. 그 때는 안도했지만, 요즘도 가끔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그 권총이 생각난다.
총기의 두려움과 관계된 내 직접적 경험은 공권력과 관련돼 있다. 흑인들이 경찰 총에 맞아 죽는 동영상을 많이 봐서 그렇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적 공간에서도 두려움은 따라다닌다. 영화관에서, 병원에서, 쇼핑몰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반자동 소총을 갈기면 어떡하지? 워싱턴 시내를 걷는데 누군가 총을 꺼내들고 위협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미친 사람이 들어와 총을 난사하면 어떡하지?
내가 외국인이고, 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난 달 말 콜로라도의 한 병원에서 총기난사로 3명이 사망한 뒤 닷새 만에 로스앤젤레스 인근 장애인시설에서 14명이 사망한 총기사건이 일어나며 상당수 미국인들도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됐다.
두 사건이 일어난 뒤 뉴욕타임스가 웹사이트를 통해 ‘대량 총기사건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을 공유해달라고 하자 하루만에 5000여명이 참여했다. 쇼핑몰에 갈 때마다 늘 주변에 숨을 곳이 어디인지,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60대 여성, 작년에 캠퍼스 내 총기 위협이 있은 뒤 총을 든 괴한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악몽을 꾸곤 한다는 20대 여성…. 사연들은 끝없이 이어진다. 트라우마 환자들의 나라처럼 느껴진다.
샌버나디노 총격사건이 자생적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행위로 드러나 미국사회에 충격을 안겨주면서 총기규제 논의는 묻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의 상식만 갖고 있다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이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까다로운 출입국 통제로 이슬람국가(IS) 요원이 입국하기는 어려워도, 자생적 극단주의자이건 백인우월주의자이건 정신이상자건 미국에 사는 한 총을 구하기는 쉽기 때문이다.
‘총기사건 추적자’라는 단체에 따르면 올 한해 4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대량 총기사건은 353건, 사망자는 1만2223명이었다. 이 가운데 62건이 학교에서 일어났다. 가디언은 1775년 독립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외국과의 전쟁이나 테러 사건으로 숨진 미국인(117만여 명)보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총기 사건으로 숨진 미국인(138만여 명)이 더 많은데도 미국 스스로 총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떠올리며, 미국의 총기 문제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인도적 사안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량 총기사건이 있을 때마다 총기규제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늘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된다. 미국 총기 논쟁의 초점은 인구보다 더 많은 3억5000만여 정에 달하는 총기의 전면 폐기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위험한 사람에게는 총기 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내주자는 주장조차 헌법에 규정된 총기 소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배척당한다.
개인의 총기 소유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주가 연방정부를 믿지 못하는 건국 원리에 따라 헌법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총기에서 오는 불안감을 나의 총기 소유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더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 간에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군비경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미국 사람들은 언제라도 누군가의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런 두려움에 익숙해진 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도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가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