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진 건지면 월척 낚은 기분"
'빛으로 쓴 편지' 연재 왕태석 한국일보 기자
“요즘은 즐겁습니다. 무조건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완벽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1992년 입사해 올해로 25년차를 맞은 왕태석 한국일보 기자는 요즘 같이 일하면서 흥이 날 때가 없다고 했다. 매주 수요일 ‘빛으로 쓴 편지’를 연재하면서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사진 앵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보도사진이 아닌 광고사진을 전공했거든요. 때문에 완벽한 장면에만 셔터를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언론사에 입사하면서 그 성질 다 죽였죠. 거친 현장에서 좋은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셔터를 눌러야 했으니까. 하지만 요새는 완벽한 장면이 나올 때 한 컷씩 찍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빛으로 쓴 편지’라는 포토에세이 형식의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처음에는 글로 빽빽한 오피니언 면에 쉬어가는 곳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코너지만 점점 반응이 오자 지난해 6월부터는 아예 그의 이름을 내걸고 연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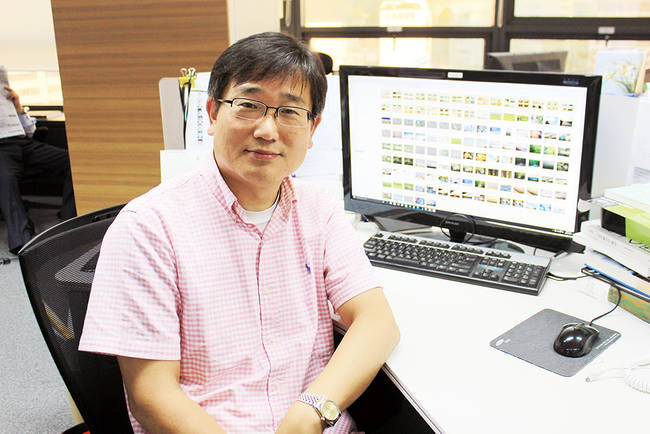 6년차 내근 데스크인 왕 기자에게 이 코너는 그야말로 유일한 낙이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몇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근무 후, 야근 마치고, 쉬는 날 촬영을 나가도 군말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6년차 내근 데스크인 왕 기자에게 이 코너는 그야말로 유일한 낙이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몇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근무 후, 야근 마치고, 쉬는 날 촬영을 나가도 군말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가 찍는 사진은 언뜻 보면 그저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것 같지만 당시의 이슈와 연관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십상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내시 무덤을 찾아가고, 보름이 되면 달이 예쁘게 뜨는 곳을 찾아가는 식이다.
“짧은 글까지 쓰기 때문에 사진에 의미를 안 담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동안 못 본 장면을 보여주려고 남들이 안 가는 장소, 찾지 않는 시간이나 계절·기상 조건에서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위에서는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좋은 데 가서 좋겠다’ ‘힐링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요.”(웃음)
그의 말대로 그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곳, 한적한 시간에 사진 촬영을 한다. 하지만 180cm가 넘는 키에 어울리지 않게 겁이 많은 그는 주로 밤에 진행되는 사진촬영이 힘들다고 했다. “달이 예쁘게 뜬다고 해서 충북 영동 월류봉에 간 적이 있는데 막상 올라가니 무당집도 보이고 귀신 생각도 나고 물소리는 크게 들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4컷 찍고 도망갔어요.”
일주일에 한 편씩 꼬박꼬박 연재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이다. 월요일에 기사를 마감하면 또다시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이야기가 되면 그림이 안 되고, 그림이 되면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오는 황금연휴에도 사진 고민을 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홍보맨을 자처하는 아들의 응원과 후배들의 격려 전화는 그에게 큰 힘이자 100회를 훌쩍 넘기게 한 원동력이다. “낚시나 골프를 가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하지만 막상 가면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하죠. 사진도 마찬가지에요. 온갖 스트레스를 받지만 막상 가서 좋은 사진을 건지면 월척 잡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코너를 연재하고 싶어요. 언젠가 200회가 되면 좋은 사진 몇 장 건져 전시회도 하고 싶습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