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동정범'이 던진 질문
[스페셜리스트 | 문화] 장일호 시사IN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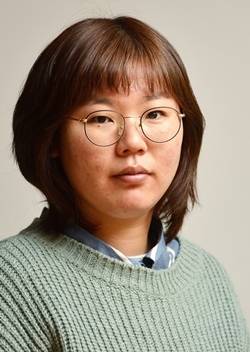 한때 외신 사진기자였던 홍진훤 사진가는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철저한 포토저널리즘 신봉자’였다. 사진으로 세상을 고발하고 어쩌면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다. 2009년 1월20일 벌어진 용산참사 전까지는 그랬다. “내가 보고 느낀 것과 내가 찍은 사진과 이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보이는 게 너무 달랐어요.” 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울부짖는 현장을 담은 사진은 그 자체로 불행의 스펙터클을 전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사진은 사람들에게 참사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대신, 참사의 의미를 정의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한때 외신 사진기자였던 홍진훤 사진가는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철저한 포토저널리즘 신봉자’였다. 사진으로 세상을 고발하고 어쩌면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다. 2009년 1월20일 벌어진 용산참사 전까지는 그랬다. “내가 보고 느낀 것과 내가 찍은 사진과 이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보이는 게 너무 달랐어요.” 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울부짖는 현장을 담은 사진은 그 자체로 불행의 스펙터클을 전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사진은 사람들에게 참사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대신, 참사의 의미를 정의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홍씨는 용산참사 이후 보도사진을 그만뒀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같은 이유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현장에서 본 것과 언론에서 참사가 다뤄지는 양상이 달랐다. 너무 달랐다. 참사 이후 몇날 며칠 남일당 주변을 서성였다. 오라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는 장소를 혼자 뱅글뱅글 돌면서 기형도의 시 <조치원>을 떠올렸다. “그러나 서울은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주니까요”라는 문장을 몇 번이고 외며 생각했다. 이 도시가 가르친 분노를 잊지 말자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바보는 되지 말자고. 그해 시월 나는 기자가 됐다. 2009년 용산 참사는 이처럼 누군가‘들’의 삶의 지문을 바꿔놓았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도 누군가에게 그랬을 것이다. 나는 몇 년 뒤, 아무런 연고 없이도 세월호 참사 현장을 서성였던 이를 후배로 받게 될지도 모른다.
얼마 전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을 봤다. <두 개의 문>(2011) 후속작이다. <두 개의 문>은 경찰 특공대원의 진술, 수사기록, 재판 기록, 채증 영상 등을 통해 용산 참사의 진실을 재구성한다. 그 결과물이 워낙 훌륭했던 까닭에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을까’를 의심하며 극장에 들어섰다. 내가 틀렸다. 참사와 국가폭력을 ‘아이템’으로 다룰 때의 윤리가 무엇인지, <공동정범>은 집요하게 질문하고 성실하게 보여준다. 전작 <두 개의 문>이 경찰은 가해자이고 철거민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부숴버렸던 것처럼, <공동정범>은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또 다시 쌓아간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방치하는 동안 김일란·이혁상의 카메라는 우리가 잊어버린 질문을 환기시킨다. 대체,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나는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러웠다. 그러나 영화는 죄책감보다 크고 깊다. <공동정범>의 누적 관객 수는 3468명이다(1월28일 기준). 이 영화를 이렇게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다. 독립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찾아보는 일은 수고스럽다. 시간도, 장소도 마땅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수고와 관심이 모여 경고가 될 수 있다. 나는 <공동정범>의 관객 수가 무람없이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