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호·백성희를 기억하며
[스페셜리스트 | 문화] 박돈규 조선일보 주말뉴스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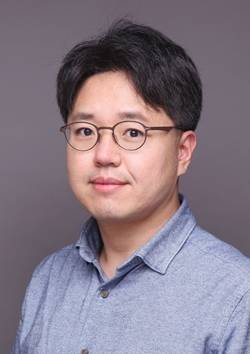 브라질 작가 파울루 코엘류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띄웠다. ‘Reality is different from fiction. In fiction, things need to make sense(현실은 소설과 다르다. 소설에선 모든 게 이치에 맞아야 한다).’ 그 문장을 보며 ‘세상은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가’ 하는 불평으로 읽었다. 지구 반대편도 현실은 으레 팍팍하구나 싶었다. 어쩌면 그래서 문학과 연극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브라질 작가 파울루 코엘류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띄웠다. ‘Reality is different from fiction. In fiction, things need to make sense(현실은 소설과 다르다. 소설에선 모든 게 이치에 맞아야 한다).’ 그 문장을 보며 ‘세상은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가’ 하는 불평으로 읽었다. 지구 반대편도 현실은 으레 팍팍하구나 싶었다. 어쩌면 그래서 문학과 연극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문학과 연극의 풍경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고발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예술가들은 저마다 장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정신적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이 가깝고 얕아서 더 위중하다. 30년 넘은 극단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추가 폭로가 나오며 여진도 잇따를 조짐이다.
연극 동네엔 ‘배우는 가장 깨끗한 수건으로 무대를 닦고 가장 더러운 걸레로 자기 몸을 닦는다’는 말이 있다. 진실을 말하되 허구로 말하는 것, 거꾸로 비추어 바로 보게 하는 것, 모순 어법이다.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이토록 썩었을 줄이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작가가 쓴 시, 그런 연출가가 만든 연극이 과연 몇 그램의 진실을 담을 수 있나.
빈집처럼 휑뎅그렁해져 극장에 갔다. 국립극단 원로 배우였던 고(故) 장민호·백성희를 기리는 헌정 연극 ‘3월의 눈’(3월11일까지 서울 명동예술극장)을 다시 보았다. 장민호가 연기한 ‘장오’, 백성희(본명 이어순이)가 맡은 ‘이순’은 그들의 이름에서 따왔다. 1945년 황해도에서 혈혈단신 월남한 장민호의 개인사도 이야기에 녹아 있다.
오래 묵은 한옥집을 배경으로 장오와 이순의 하루가 담백하게 펼쳐진다. 장오는 손자가 진 빚을 갚느라 집 팔아 요양원으로 가야 할 처지다. 사별한 이순과 꿈을 꾸듯 대화하며 그는 문창호지를 바른다. 해체돼 흩어지는 집처럼 다 비우고 가는 인생을 서정적으로 응축했다. 모델이 된 두 배우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작품은 남아 이렇게 레퍼토리로 공연된다. 오현경·손숙이 주연한 이번 무대에서 일꾼들이 문짝과 마루를 쿵쾅쿵쾅 뜯어내는 장면에 이르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생전에 장민호·백성희가 들려준 말이 떠올랐다.
“3월에 내리는 눈은 금방 녹아 없어지지. 인생이 그래. 나이 들어 없어지면 그만이지 뭐. 연극도 커튼콜 박수소리와 더불어 소멸하는 게 매력이고.”(장민호)
“지위가 있나, 모아놓은 돈이 있나. 이 연극, 딱 나를 보는 것 같애. 평생 연극만 보고 살아왔잖아. ‘조금 덜 세련되지만 순수하게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낯부끄럽지 않게 하게 돼.”(백성희)
사람은 관 뚜껑을 닫아봐야 그 가치를 안다. 어느 해보다 질척질척한 이 겨울에 장민호·백성희를 기억하며 곱씹는다. 널리 알려진 거장이 ‘괴물’은 아닌지 눈을 씻고 뒤집어 보자고. 3월의 눈처럼 금방 소멸하는 인생, 덜 세련되어도 괜찮으니 좀 더 순수해지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