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기사쓰기의 '잘못된 만남'
[언론 다시보기] 이진송 계간홀로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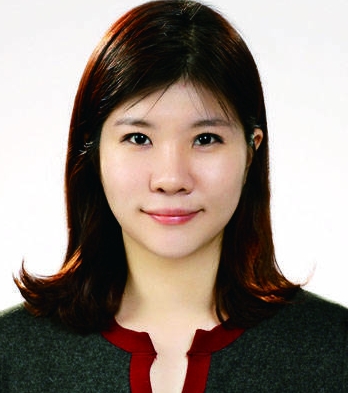 전공을 밝혔을 때 상대가 높은 확률로 전공자의 진을 빼놓는 과가 있다. 철학과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사주’를 봐달라고 하거나, 컴퓨터공학과면 상대가 갑자기 컴퓨터 A/S를 문의하는 고객으로 돌변한다.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소설을 전공한 내 앞에서는 왕년의 문학 청년들이 자신의 습작을 고백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썼고 쓰고 싶어한다. 서사 붕괴의 시대라지만 여전히 이야기의 힘은 세다. 그래서일까? 문학적이고 극적인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이런 기사들은 건조한 사실 나열보다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짙어 보인다. 그러나 문학적인 글쓰기, 극적 창작이 기사쓰기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잘못된 만남은 위험하다.
전공을 밝혔을 때 상대가 높은 확률로 전공자의 진을 빼놓는 과가 있다. 철학과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사주’를 봐달라고 하거나, 컴퓨터공학과면 상대가 갑자기 컴퓨터 A/S를 문의하는 고객으로 돌변한다.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소설을 전공한 내 앞에서는 왕년의 문학 청년들이 자신의 습작을 고백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썼고 쓰고 싶어한다. 서사 붕괴의 시대라지만 여전히 이야기의 힘은 세다. 그래서일까? 문학적이고 극적인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이런 기사들은 건조한 사실 나열보다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짙어 보인다. 그러나 문학적인 글쓰기, 극적 창작이 기사쓰기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잘못된 만남은 위험하다.
당사자를 어떤 이야기의 캐릭터처럼 가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사례이다. 정보나 행위를 특정한 반응을 유도하도록 선별, 배치하고(수염이 자란/수척한 얼굴,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 등), “~해보인다” 같은 주관적 평가를 넣거나, 사건과 무관한 일화나 증언을 삽입하는 식이다. 익숙한 원형에 빗대어 ‘두 얼굴의 OO’, ‘몰락한 영웅’처럼 묘사하면 당사자는 지킬앤하이드나 오셀로 같은 비극의 주인공에 비견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인물에 대한 흥미나 도덕적 판단, 감정이입 등의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그 다음은 개연성이다. 사건 간의 개연성을 어떻게 짜는지가 서사의 메시지와 완성도를 결정한다. 얼마 전 여성 소방관 3명이 출동했던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수많은 언론이 “‘개 잡아달라’ 신고에 출동했다가…”, “동물 포획 위해 출동한…”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런데 사고는 개가 아니라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던 트럭운전기사가 냈다. ‘개/개가 있다는 신고’와 소방관들의 죽음을 개연성의 고리로 묶어버린 것은 극적인 연출과 소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사람이 아닌 개’ 때문에 출동했기에 그 죽음이 허무하거나 더 안타깝다는 반응을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건을 그렇게 보도할 이유가 없다. 주 84시간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업무 강도가 지나친 것도, 인력 낭비나 과로의 원인이 되는 ‘덜 위급한’ 신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고의 원인은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출동 내용과 사고를 연결짓는 것은 문제적이다.
비유나 상징을 남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성범죄를 ‘미투’, ‘나쁜 손’, ‘몹쓸 짓’, 스토킹을 ‘엇나간 사랑’, 절도를 ‘슬쩍’이라고 표현하여 본질을 가리고 사안의 심각성을 은폐한다. ‘짐승 같은/짓밟힌 인생/’, ‘~의 눈물’ 같은 비유도 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역할 외에는 무용하다.
아무리 통섭과 융합이 대세라고 해도 세상에는 만나선 안 되는 조합이 있다. 기사쓰기와 창작도 그 중 하나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은 그러나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은 훨씬 더 시시하고 우연적이고 지루한 파편들로 가득하다. 삶의 무게는 음모나 공작, 인과관계 없이도 묵직하며 인간은 완결된 창작물 안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매끄럽고 유기적인 서사의 유혹을 피하지 못하면, 펜은 얼마든지 찌르는 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