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없었다면, 대법원 판결로도 복직 어려웠을 겁니다"
[인터뷰] 김태식 연합뉴스 문화부장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시민혁명, 정치혁명이 아니었으면 설혹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복직하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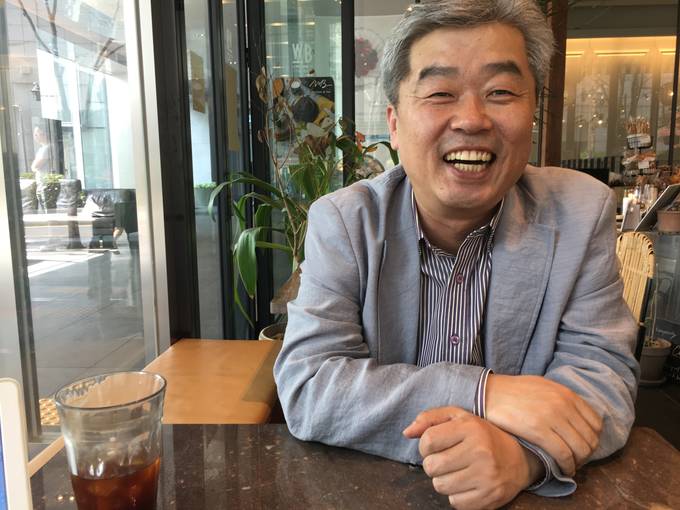
당연한 듯 보이는 말도 누가 하냐에 따라 달리 느껴질 수 있다. 김태식<사진> 연합뉴스 문화부장은 지난 20일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제게 중요한 건 문화부를 어떻게 운영해 좋은 기사를 많이 생산할지 그거밖에 없다. 국가기간통신사가 국민에게 돌려줄 게 좋은 기사 많이 쓰는 거 말고 뭐가 있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그는 해고당했었다. 사측은 부당한 목적으로 가족돌봄신청을 하고 인사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지만 회사 안팎에선 2009년 노조 집행부로 자사 ‘4대강 특집’ 기사를 비판하고, 2012년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에 참여한 그가 ‘찍힌 것’이란 목소리가 많았다. 대법까지 간 쟁송에서 승소하고 김 기자는 복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 경영진은 그에게 문화부장직을 맡겼다.
문화재 전문기자로 이름을 날리던 김 부장에게 보직을 맡게 돼 전문 분야와 멀어진 게 아쉽진 않냐고 물었다. 그는 “조만간 평기자 인사가 나면 새 친구들과 ‘이런 기사도 연합에서 보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당장은 기자를 더 안 뺏기면 좋겠다”며 새로 맡은 관리자로서의 본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현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문기자제’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10~20년 전부터 다들 전문성을 강조해 왔는데 내부에선 전문기자가 도태되는 역설이 벌어져요. 보직에선 멀어지고 안식년이나 연수 같은 기회도 없고요. 새 경영진이 전문기자를 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런 제도가 정착되는 데 제가 표본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