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정규직 기자도 해고된다, 인종·나이·성차별만 예외일 뿐"
[기자들의 삶 / 세계 언론인과의 대화] ③ 미국
세계 언론 1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 ‘언론의 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지역 중 하나다. 워싱턴 D.C., 뉴욕과 더불어 자국 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수 언론이 여기 자리한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제퍼슨의 말은 이 나라에서 언론이 차지한 위상을 드러낸다. 그 역할은 매일매일 기자들의 일상을 통해 오늘날까지 수행되는 중이다.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을 공통분모로 지역성에 기초한 전문성이 무기가 된다. 다만 서부의 맹주라 할 이 언론들도 산업 전반의 침체를 체감한다. 기자들로선 오너십 교체와 빈번한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화로 다가오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양분된 인식도 고민거리다.

◇새 사주 맞은 LA타임스 기자의 일상
“저희가 제일 잘 하는 건 캘리포니아를 취재하는 거죠.”
지난달 10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LA타임스(Los Angeles Times) 사옥에서 만난 빅토리아 김(Victoria Kim) 기자는 자신의 말을 온전히 실천하는 중이었다. 인터뷰 직전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과 관련한 기사를 쓰고 에디터에게 데스킹을 맡겨둔 참이었다.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에 따라 부모와 자식이 강제 격리되며 전미가 들끓고 있었다. 멕시코 국경과 근접하고 ‘멜팅팟’ 안에서도 가장 인종 다양성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 이슈는 무게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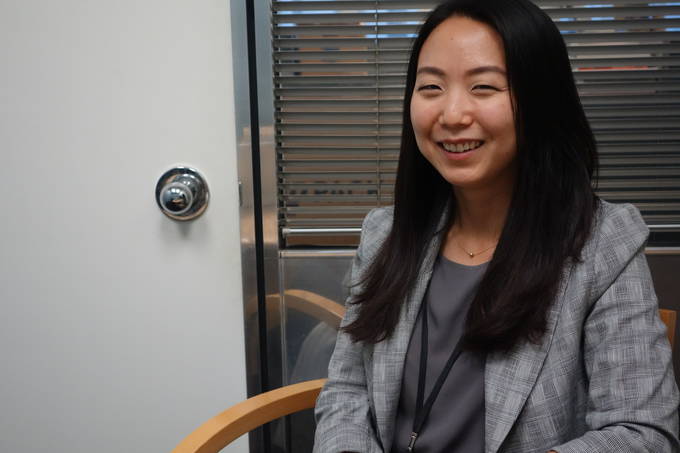
특히 김 기자는 최근 큰 이슈가 있었던 한인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비트(beat·출입처)’로 담당해 왔다. LA시가 한인 타운에 노숙인 주거지를 건립하려 하면서 극렬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던 터였다. 그는 “1970~80년대 오신 분들의 자제들이 미국사회에서 중요 위치에 오르며 목소리를 내는 단계”라며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보여주면서도 이곳 미래를 누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1881년 설립된 LA타임스는 미국 내 발행부수 4~6위권에 드는 신문사다. 일요판 69만부, 평일판 44만부를 찍고 월간 디지털 순방문자가 3300만 명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 다음으로 퓰리처상을 많이 수상한 언론사이기도 하다. 남한 네 배 면적보다 큰 캘리포니아주를 주요 시장으로 한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김 기자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2007년 이 신문사에 입사하며 해당 지역과 연을 맺었다. 대학 시절 방학 기간을 이용해 ‘홈타운 페이퍼’라 할 AP통신 서울지국에서 인턴을 했다. 서아프리카(세네갈)에서도 인턴기자로 3개월을 보냈고, 졸업 직후엔 뉴욕 파이내녈 타임스에서 인턴십을 수료했다. 학교 신문인 ‘크림슨(Crimson)’에서도 활동했으며 4개 국어를 한다.
김 기자는 신참 시절 제너럴 어사인먼트 리포터(general assignment reporter)로 여러 분야를 경험했고, 트레이닝을 마친 직후인 2008년부터 주 법원을 3~4년 간 담당했다. 이후엔 연방법원을 쭉 출입하며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잉글우드 경찰의 비무장 용의자 사살, 미인가 로스쿨 실태 등 탐사보도 프로젝트도 적극 참여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는 등 우리나라 관련 사안도 다룬다. 입사 후 1~2년은 근무시간당 페이를 받는 ‘리포터1’ 시기를 거쳤다. 대부분의 기자가 속한 ‘리포터2’ 레벨이 되면 ‘샐러리’를 받는다.
LA타임스 기자라고 하루가 특별히 다르진 않다. 오전 9시 반 출근, 오후 6시 반~7시 사이 퇴근.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일과다. 신문은 주 7회 발간되고 기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한다. 주말 당번은 4개월에 3~4번꼴로 돌아온다. 주말에 에디터에게 연락이 오고,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한 것은 우리와 매한가지다.

LA타임스 기자들은 최근 새 사주를 맞으며 전기를 맡고 있다. 지난달 말 LA공항 인근의 엘 세군도(El Segundo)로 사옥을 이전하고 800여 직원 대다수가 보금자릴 옮겼다. 일부 매체에선 헤지 펀드사가 오너십을 획득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소란스럽지만 워싱턴포스트나 보스턴 글로브, 미네아폴리스 스타 트리뷴처럼 기자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김 기자는 “인수해서 겹치는 것 다 자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팔겠다는 게 아니라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갖는 책임을 중요하게 얘기해 와서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시기”라고 했다. 이어 “로컬 오너십으로 돌아갔다는 걸 중요하게 본다. 캘리포니아를 중시하는 언론사로 클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임 오너였던 시카고 기반 미디어그룹 트롱크(tronc) 시기 기자들은 수차례 구조조정을 겪었다. 인수 전 트롱크는 워싱턴지국을 폐쇄하고 직원 중 20%를 해고할 계획이었다. 137년 역사 동안 반노조의 사풍을 보였던 LA타임스에서 올초 노동조합이 생긴 배경이다. 지난 6월 LA타임스를 비롯해 3개 매체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뉴스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중국계 외과의사 출신의 억만장자 패트릭 순시옹은 10개월 간 3명의 편집국장, 4년 동안 5명의 발행인을 거친 뉴스룸을 안정시킬 것이라 공언했다.
잦은 구조조정은 미국 언론 전반에서 확인되는 경향이다.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주말판 발행부수 5만부 이상의 미국 대형 신문사 110개사 중 3분의 1 이상(36%)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말 사이 구조조정을 겪었다. 발행부수가 많은 곳일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졌다. 5만부 이상은 30%, 10만부 이상은 36%, 25만부 이상은 56%의 신문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업계 전반의 위기는 미국 언론도 체감한다. LA타임스만 해도 한 때 1200명의 언론인과 해외 25개 지국이 있었던 황금기를 지나 현재 400명의 기자와 일부 지국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처럼 최소 15년의 경력을 거쳐 가장 마지막에 입사 가능했기에 “벨벳으로 쌓인 관(velvet coffin)”으로 불렸던 LA타임스지만 이젠 버즈피드(Buzzfeed)나 복스(Vox) 같은 매체로 떠나는 기자들도 많아졌다. 김 기자는 “한 때 필라델피아 지역 신문에서도 서울 지국을 두고 내셔널, 인터내셔널 이슈를 모두 경쟁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언론사 축소와 함께 지금은 로컬뉴스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기자의 고민은?
미국 공영 라디오 NPR(National Public Radio)의 네이선 롯(Nathan Rott) 기자는 불과 2주 전까지 콜로라도의 산 속을 헤매다 왔다. ‘마못(marmot)’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그는 환경 분야를 담당한다. “큰 쥐라고 보면 된다. 이 귀엽고 굉장히 흥미로운 애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산 고도별 지형이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생물이다. 많은 환경 이슈는 경제·정치 변화가 그대로 투영되는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취재한 거다.”
지난달 12일 롯 기자를 만난 건 LA 근교 컬버시(Culver city)에 위치한 NPR 서부본부였지만 사실 그는 대부분을 “길 위에서 산다.” 기본적으론 브레이킹 뉴스 담당 기자여서다. “허리케인, 산불, 홍수, 총기사건 뭐든 생기면 어디든 가는 게” 일이다. NPR은 PBS와 더불어 미국 대표 공영방송 중 하나다. 워싱턴 D.C. 등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십 여 명이 서부 전체를 커버한다.

아무 일이 없으면 오전 8~9시 사이 출근해 오후 6시~6시30분 사이 퇴근한다. 새벽 한 시에 깨 별 일이 없으면 다시 자고, 일이 터지면 “다음 비행기를 타라”는 지시를 받는 식이다. 보통은 주 40시간 단위로 일하지만 브레이킹 뉴스가 있으면 하루 19~20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엔 아직 시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는 정규직이다.
올해 31살인 롯 기자는 2010년 워싱턴포스트와 NPR에서 총 8개월 간 펠로십을 하며 언론계를 맛봤다. 모교인 몬타나대에선 저널리즘과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다. NPR에 자리잡은 건 지난 2014년 5월이었다. “스토리텔링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걸 좋아하고 몸 쓰는 일을 선호하는 성격”에 정착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2011년엔 남극 맥머도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의 생활을 돕는 어시스먼트로 일했고, 2012년 가을엔 알래스카에서 수십만 마리의 연어를 잡았다. 그렇게 두세 달을 일하고 1만~1만5000달러를 벌어 쓰고 싶은 기사를 쓰는 삶. “파산할 쯤 같이 일했던 상관이 불러” 자리 잡은 게 현재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환경 이슈 관련 기사를 찾아보거나 이메일에 답하고” “기자들이 너무 많이 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공영 미디어 분야에 일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정말 시골에 가면 뉴욕타임스는 안 봐도 NPR은 듣는다. 그게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사랑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헤지펀드 언론사주가 공익을 그렇게 생각할 건 같진 않다. 뉴스 가치가 날로 떨어지기에 더욱 큰 역할이 공영미디어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영미디어 펀딩 축소 움직임에 대해선 “항상 위협이다. 재원구조상 우리는 펀딩을 받지 않는다. 수수료를 내고 네트워크에 속하는 중소도시 회원사는 연방정부 예산을 더 많이 받기에 문제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프리랜서 기자와 민영 네트워크 TV방송사 기자들의 삶
미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는 보편적인 고용형태다. 전 미국기자협회(SPJ) 회장인 린 월시(Lynn Walsh)는 자발적으로 프리랜서의 길을 걷는 경우다. 대학에서 방송 저널리즘을 전공한 이 10년차 기자는 그간 총 여섯 곳의 TV스테이션에서 일했다. 탐사보도와 데이터·디지털 저널리즘 전문가로 에미상(Emmy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3년 간 샌디에고(San Diego) NBC7에서 탐사보도팀장을 맡았고, 현재는 지역 대학 강사, 언론신뢰 회복을 위한 ‘트러스팅 뉴스 프로젝트’ 매니저를 겸하며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월시 기자는 “프리랜서 기자로 지낸 지 8개월 쯤 됐다. 나로선 회사에 몸담은 채 결코 할 수 없었던 모험과 실험의 기회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노’를 할 수 있다. 25%의 시간은 학생이나 기자 교육에, 25%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나머지 50%는 기사작성에 투자한다”고 했다.
월시 기자는 “프리랜서 기자로 지낸 지 8개월 쯤 됐다. 나로선 회사에 몸담은 채 결코 할 수 없었던 모험과 실험의 기회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노’를 할 수 있다. 25%의 시간은 학생이나 기자 교육에, 25%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나머지 50%는 기사작성에 투자한다”고 했다.
프리랜서 생활은 온통 협상의 과정이다. 기사 종류와 경력에 따라 페이가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킹 뉴스는 단어수로 돈을 지불한다. 단어당 10센트부터 2달러 범위다. 기사당 정액을 지불할 때도 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기고해 45달러를 받았다. 반면 다른 기구에 낸 탐사보도는 500달러를 받았다. 또 다른 재단과 진행 중인 데이터 작업에선 시급을 받는다. 이 역시 시간당 16달러부터 150달러범위로 모든 게 협상이다. “연말 쯤 잔고가 바닥나면 다시 풀타임을 찾을지 모른다. 의료보험도 없고, 돈이 제 날짜에 들어오리라는 법도 없다. 아이가 없기에 가능하다.”


월시 기자가 몸담았던 NBC7에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들도 치열하긴 마찬가지다. 후임자인 톰 존스(Tom Johns)와 팀원들은 최근 지역 수도계측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수도관리당국을 신랄히 지적하는 탐사보도물을 내놨다. 당국은 시스템 오류로 ‘수도세 폭탄’을 맞은 주민들이 속출하는데도 ‘문제없다’로 일관해 왔지만 마침내 일부 문제를 시인했다. 존스 팀장은 “근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팀원들은 각자 처리해야 할 다른 마감이 있다. 수천페이지 문서를 구해 주말과 평일 틈틈이 읽어 내놓은 리포트다. 여유 시간에 항상 다른 일을 한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NBC7 사옥에서 만난 존스와 도리안 하그로브(Dorian Hargrove) 소비자 탐사 프로듀서, 아이린 변(Irene Byon) 프로듀서는 각각 주당 60~65시간, 55~60시간, 45~50시간을 일한다고 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케이블 방송인 NBC7은 350만 주민 중 TV수상기를 가진 약 100만명을 마켓사이즈로 한다. 히스패닉 비율이 높아 텔레문도20(Telemundo20)이라는 스페인 매체도 한 지붕에서 운영된다. 총 100여명의 기자가 있다.
현재는 괜찮은 시기다. 고용도 안정된 편이고 뉴스룸도 커지고 있다. 올해 미국 라디오 TV 디지털뉴스 연합(RTDNA)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로컬 TV와 라디오방송사 직원의 임금은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곳 역시 10여년 전 큰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렉 도슨(Greg Dawson) NBC7 부사장은 “지금은 안정기다. 큰 성장을 보이진 않지만 평평한 건 괜찮다”며 “2008, 2009년에 심각했다. 연간 직원 30%가 구조조정됐다.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탐사보도는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했다.

격심한 구조조정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고용계약원칙이 ‘임의계약(Employment At Will)’인 까닭에 가능하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맺지 않는 노동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규직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인종·나이·성차별 등 일부가 예외사유로 있을 뿐이다.
노동자로서 이를 방지할 거의 유일한 방어책은 노조다. 해고 시 노조가 협상 주체로 나선다. 다만 사회 전체가 ‘친’ 노조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CJR)는 지난해 6월 허핑턴포스트가 39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소식을 전하며 ‘힙’한 젊은 매체로 평가받는 신생 매체 사측은 물론 노동자들도 노조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월시 기자는 “미국 언론사 노조조직률은 25%가 안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언론사 노조결성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대부분은 뉴욕이나 워싱턴D.C., 필라델피아,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 언론사에 한정된다”고 했다.
언론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 정도와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완전히 양분됐다. 지역별 차이가 크지만 ‘우버(UBER)’를 이용할 때처럼 일상에서도 체감된다. 월시 기자는 “2년 새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 전엔 기자라고 하면 ‘멋지다’는 반응과 함께 질문이 따랐는데 이젠 ‘당신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꾸며낸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분된 분위기 속에서 열성적인 응원을 받은 경험도 나온다. 롯 NPR기자는 자신의 일화를 전했다.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면 살 집을 최근 사려했는데 돈이 충분치 않았다. 현금으로 사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집을 팔고 싶어했다. ‘기자들이야말로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이들’이라면서. 그들이야 말로 지금 언론인들의 든든한 뒷배가 아닐까.”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