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같은 영화를 보았습니까
[스페셜리스트 | 문화] 장일호 <시사IN>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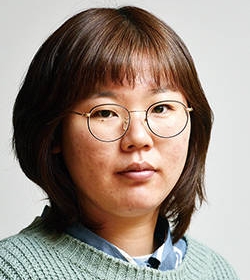 바닥으로 촤악, 물이 쏟아진다. 연이어 들리는 규칙적인 비질 소리. 청소하는 게 분명한 소리가 반복되는 동안 바닥에 생긴 물웅덩이가 손바닥만 한 하늘을 만든다. 그 위로 손톱 크기의 비행기가 고요하게 지나간다. 영화 <로마>의 첫 5분은 그 자체로 너무 강렬해서 나는 영화가 시작되고도 한동안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다. 대사 한 마디 없이, 사람 그림자조차 등장시키지 않고 관객의 넋을 빼앗는다. 흑백이 이토록 풍부하게 화려할 수도 있다는 시각적 충격은 덤이다.
바닥으로 촤악, 물이 쏟아진다. 연이어 들리는 규칙적인 비질 소리. 청소하는 게 분명한 소리가 반복되는 동안 바닥에 생긴 물웅덩이가 손바닥만 한 하늘을 만든다. 그 위로 손톱 크기의 비행기가 고요하게 지나간다. 영화 <로마>의 첫 5분은 그 자체로 너무 강렬해서 나는 영화가 시작되고도 한동안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다. 대사 한 마디 없이, 사람 그림자조차 등장시키지 않고 관객의 넋을 빼앗는다. 흑백이 이토록 풍부하게 화려할 수도 있다는 시각적 충격은 덤이다.
가난은 바쁘다. 그 분주함에는 주도권이 없다. 입주 가정부 클레오는 아이들과 한데 엉켜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한창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다음 장면을 볼 수 없다. 고용주는 그의 기쁨과 슬픔에 상관없이 다과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과 일상을 구분할 수 없는 클레오의 삶은 가난과 한 덩어리로 단단히 묶여 있다. 그에게 비행기는 가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서 가난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타인의 가난과 그 가난을 만든 사회의 불평등은 굳이 애써야만 보이는 무엇이다. 그래서 때로 예술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당하려 한다. 어쩌면 그게 예술의 사명일지도 모른다. <로마>는 ‘백인 중산층’ 집안의 아들이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자전적 영화다. 어린 쿠아론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유색인 여성 노동자의 신산한 삶이, 40년의 세월을 건너 비로소 <로마>가 되었다. 깊은 이해와 존중이 그 시간의 더께만큼 소복하다.
<로마>는 넷플릭스가 제작하고 배급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다. 지난해 12월12일 국내에서 개봉했고, 이틀 뒤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영화의 다양성은 넷플릭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이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로마>가 극장에서 볼 때에만 감독이 의도한대로 영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나 역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기 위해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극장에 ‘굳이’ 찾아갔다. 지난해 12월30일 영하 17도의 강추위에도 경기 파주 명필름 아트센터 극장은 만석이었다.
그래서 질문이 남는다. 넷플릭스로 <로마>를 본 관객과 극장에서 <로마>를 본 나는 같은 영화를 본 걸까. 2018년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로마>는 지난 7일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과 감독상마저 거머쥐었다. 국내 멀티플렉스 3사와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만이 여전히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외면하고 있다. ‘영화란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싸우고, 다시 합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