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과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에서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출판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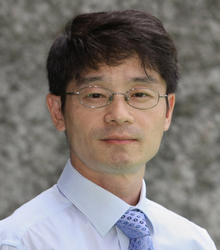 지난 5월 미디어 스타트업 <뉴닉>을 방문해 김소연 공동대표를 만났다. 철지난(?) 이메일 뉴스레터로 사람들의 반향과 호응을 끌어냈다는 점이 신기했다. 201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해 불과 5개월 만에 3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직원은 5명이다. 10년 전쯤 기존 언론사들이 앞다퉈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낸 적이 있다. ‘아침마다 주요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며, 대략 5~15개 정도의 기사를 모아서 신청자에게 보내줬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스팸이 됐다. 지금 많은 언론사들은 뉴스레터 프로그램을 접었다.
지난 5월 미디어 스타트업 <뉴닉>을 방문해 김소연 공동대표를 만났다. 철지난(?) 이메일 뉴스레터로 사람들의 반향과 호응을 끌어냈다는 점이 신기했다. 201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해 불과 5개월 만에 3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직원은 5명이다. 10년 전쯤 기존 언론사들이 앞다퉈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낸 적이 있다. ‘아침마다 주요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며, 대략 5~15개 정도의 기사를 모아서 신청자에게 보내줬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스팸이 됐다. 지금 많은 언론사들은 뉴스레터 프로그램을 접었다.
<뉴닉>의 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지금 <뉴닉>에선 되는 일이, 그때 기존 언론사에선 안 됐는지’ 알 것 같았다. <뉴닉>은 철저히 ‘고객 중심’이다. ‘독자’가 아닌. 비즈니스·서비스 마인드로 똘똘 뭉쳐 있었다. 뉴스 선정 때부터, 자신들의 그때그때 ‘감’이 아닌, 미리 만들어 놓은 체크리스트를 펼쳐놓고 따졌다. ‘고객 니즈(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뉴닉>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고객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타깃 독자층도 25~35살 사회초년생으로 좁혔다. 이어 끊임없이 물었다. 설문조사, 오픈 채팅방, 독자들과의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이메일마다 ‘뉴닉에게 알려주기’ 배너를 부착해 상시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하루 평균 20~30건, 많을 때는 200~300건의 독자 의견을 받는다. “(뉴스레터 문체를) 반말이 나은지, 존댓말이 나은지, 이모티콘은 몇 개나 넣는 게 적당한지 등도 묻는다” 했다.
기존 언론사의 공급자 마인드는 알아도 못 고치는 고질이다. 독자와의 소통 확대, 가볍고 상시적인 접촉, 무엇보다 독자 최우선주의 등 기존 언론사들이 신생 미디어 스타트업인 <뉴닉>에 배울 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기존 미디어 조직이 이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또 온전히 합당하기만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배어 나왔다. 한 걸음 떨어져 기사를 재가공하는 <뉴닉>과 딱 붙어서 사회현상과 동시호흡 해야 하는 언론사의 행동양식이 온전히 같을 순 없기 때문이다. 혜화동 <뉴닉> 사무실을 나올 때, 지난 일들이 절로 반성됐지만, 여전히 눈앞이 훤해지진 않았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 본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허탈함과는 또 달랐다.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맨해튼 본사에서 고든 페어클러프 국제에디터로부터 <월스트리트 저널> 회사 소개를 들으면서 “국제부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다. 그는 즉각 답하지 못했다. “음…, (책임자인)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특파원 포함해 대략 300명쯤 된다”고 말했다. 멍했다. “그럼 편집국 기자들은?”,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아 100명 가량 내보내, 지금 1000명쯤”이라 했다. 그 다음부턴 그의 말이 귓전에 머물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결’을 참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디지털 유료화 성공 비결’을 간략하게 설명했으나, 그들에겐 간략한 일이, 우리에겐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앞에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 <뉴닉> 앞에선 또 무슨 변명을 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