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여성 등장한 비율 실시간 분석… 독자 성비 불균형 깨는 FT
[잃어버린 독자를 찾아서/해외편] ④ 영국 FT의 여성독자 확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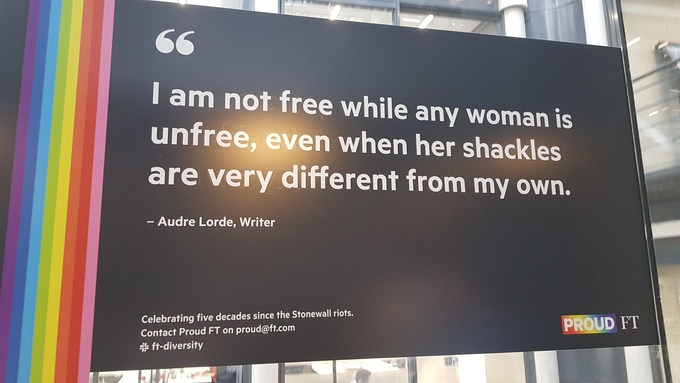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Financial Times)는 기존 독자의 참여를 늘리고 새로운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2015년 독자참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데이터 파트와 협업해 독자부터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FT 유료 구독자 중 남성은 80%에 달했지만 여성은 20%에 불과했다.
독자참여팀은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려면 현재 비중이 작은 ‘여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외부 조사를 통해 여성 독자들이 FT의 콘텐츠를 남성 중심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여성 시각에서 읽을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아냈다. 이어 자사 독자분석 툴로 FT 사이트에 방문한 여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사를 읽고 있는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등을 파악했다.
독자참여팀에서 여성 독자를 담당하는 케세와 헤네시(Kesewa Hennessy) 디지털 에디터는 “‘FT는 남성적’이라는 여성 독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목표 중 하나”라며 “여성 독자를 늘리기 위해 뉴스룸 안팎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한다. 회사 전체도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헤네시 에디터의 역할은 여성 독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을 타깃으로 한 뉴스레터 ‘Long Story Short’도 총괄한다. 그를 포함한 FT의 여성 기자들이 돌아가며 선별한 기사를 뉴스레터로 재구성해 매주 1회 발송하고 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5가지 뉴스, 여성 독자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 여성 독자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그 주 담당기자의 관심사 등을 친근한 말투로 소개하면서 독자와 스킨십을 늘린다. 여성 독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이 뉴스레터의 오픈율은 FT의 다른 뉴스레터들보다 2배 이상 높다.
데이터 분석가와 함께 여성 독자들이 FT 사이트 내에서 보인 행동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뉴스룸에 공유하는 일도 헤네시 에디터의 몫이다. 얼마나 많은 여성 독자가 접속했는지, 그들이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뉴스레터를 몇 명이나 열어봤는지 등이 실시간 측정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헤네시 에디터는 “여성 독자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실험을 해본다. 특정 기사에 사진을 몇 장이나 넣어야 여성들이 많이 읽을지 등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뉴스룸에 나누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독자 성비 불균형을 깨기 위한 FT의 노력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FT 사이트에 실린 사진에서 성평등 여부를 판가름하는 ‘자넷 봇’(Janet Bot)부터 눈길을 끈다. 이미지에 등장하는 여성의 수를 추적하고 성별이 균형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도구다. 남녀비율을 집계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그려 매일 6차례 사내에 배포한다.
사진뿐 아니라 글 기사에 인용된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성별을 분석하고 여성의 코멘트 빈도를 집계하는 툴 ‘그녀가 말했다, 그가 말했다’(She Said, He Said)도 있다. 같은 이름의 코너로, 성별에 따라 입장이 나뉘는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도 일주일에 서너 번 연재한다.
뉴스룸 전반에선 여성들을 위한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는 ‘프로젝트 XX’(Project XX)도 진행 중이다. 여성 독자들이 특히 관심 가질 만한 기사를 FT 홈페이지에 매일 올리는 방식이다. 기사 주제 선정은 편집자들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철저한 독자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금융 규제, 경제 관련 법률, 가족 이야기, 점심시간을 이용한 운동 등 폭넓은 토픽을 다룬다. 모두 여성 독자들에게 맞춘 것이다.
헤네시 에디터는 FT의 젠더 프로젝트가 이제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다양한 장치 개발부터 구성원의 인식 전환, 작업 방식 변화가 실제 결과물에 반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 또한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나선 덕분에 당길 수 있었다. 앞서 FT는 성별 균형과 여성 독자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한 뒤 편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인사 등 사내 모든 부문의 고위 임원들을 포함한 실무 그룹(Women’s Working Group)을 꾸려 내외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했다.
헤네시 에디터는 “독자참여팀의 궁극적인 목표인 독자 확장은 편집부서와 비편집부서가 통합해야 이뤄낼 수 있다. 부서 간 다툼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자 데이터에 기술을 적용한 업무는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언론사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

“한국선 왜 언론사와 독자가 바로 연결되지 않나요?”
닉 뉴먼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연구원
“한국 언론은 독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닉 뉴먼(Nic Newman·사진) 연구원은 한국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독자와 바로 만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소가 매년 발행하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주요 저자로 전 세계 미디어 트렌드를 연구하는 그는 한국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뉴먼 연구원은 한국 언론의 취약점으로 ‘언론사와 독자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 환경’을 꼽았다. 그는 “영국 독자들은 가디언이나 BBC 사이트로 직접 가지만 한국 독자들은 대게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기사를 접한다”며 “포털사이트가 뉴스의 레이아웃, 독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데이터까지 가져간다. 건강하지 않은 뉴스 유통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사들이 포털에 기대기보다 이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장 기사 1~2개는 자사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독자를 끌어오거나, 뉴스레터처럼 독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부터 제안했다.
그가 ‘직접 연결’을 강조한 이유는 세계 여러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매출 위주에서 독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서다. 기본적인 정기구독자 확대부터 최근 주목받는 후원, 기부, 개별 콘텐츠 유료화 등은 모두 독자와 직접적인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뉴먼 연구원은 “한국에선 아직도 삼성 같은 대형 광고주들이 기존 종이신문에 관습적으로 광고를 내고 있지만, 지면 구독률이 하락하고 디지털 뉴스 소비는 늘고 있어 지면 광고비용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포털이 언론사에 더 많은 수익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한국 언론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해소될 수 없다. 언론사들은 제3자를 통한 만남을 줄이고 독자와 직접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이나 소프트웨어만으론 독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저널리즘을 구현해 독자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콘텐츠 포맷을 변화하는 등 독자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언론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언론이 내놓은 콘텐츠가 삶에 도움 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기꺼이 ‘독자’가 돼 제값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언론 소비 태도는 독자가 아니라 언론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디지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은 저널리즘에서 출발해야 한다. 언론사가 신뢰를 얻은 후에야 소프트웨어를 통한 독자 분석이 유효하고, 새로운 독자를 끌어들일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들 뉴저널리즘을 이야기하지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잊어선 안 된다. 많은 기자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자신감도 잃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김달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