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가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할 때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출판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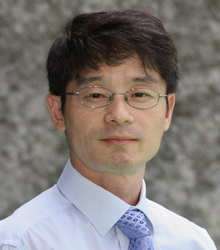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 생산자의 모든 초점은 고객 만족과 고객 창출에 맞춰진다. 미디어(Media)는 상품 측면에선 이 기조와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가끔 고객 요구와 엇나갈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지만, 과거 정치권과의 결탁, 대기업 광고주와의 결합 등 떳떳하지 못한 길도 걸어왔다. 고객으로서의 독자는 늘 뒷전으로 밀렸다. 지금까지 독자는 정보가 없었고, 속도도, 입도 없었다. 그런데 스마트한 지금의 독자는 이 모든 걸 가졌다. 미디어가 정보와 견해를 제시하면, 이를 그대로 수용했고, 맘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독자의 시대는 지나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 생산자의 모든 초점은 고객 만족과 고객 창출에 맞춰진다. 미디어(Media)는 상품 측면에선 이 기조와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가끔 고객 요구와 엇나갈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지만, 과거 정치권과의 결탁, 대기업 광고주와의 결합 등 떳떳하지 못한 길도 걸어왔다. 고객으로서의 독자는 늘 뒷전으로 밀렸다. 지금까지 독자는 정보가 없었고, 속도도, 입도 없었다. 그런데 스마트한 지금의 독자는 이 모든 걸 가졌다. 미디어가 정보와 견해를 제시하면, 이를 그대로 수용했고, 맘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독자의 시대는 지나갔다.
언론은 독자가 원치 않는 정보, 독자가 싫어하는 의견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customer)이라면 답은 명료하다. 그러나 ‘독자’(reader)로 인식한다면, 미디어는 때론 ‘고통스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고객에게 달콤한 뉴스만 들려주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나. 그러나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공(public)의 이익을 위해 때론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아플 독자를 의식해야 한다. 메스를 식칼처럼 다루면 안 된다. “독자의 심정과 사정을 읽고 그것을 건드려야 좋은 글이다. 공감해 주는 이를 멀리할 사람은 없다.”(강원국 작가)
두번째, 겸손해야 한다. 기자의 겸손이란, 매너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독자들의 반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독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독자 퍼스트’라 했을 뿐, 혹 내 의견을 주입시킬 대상으로 독자를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재고하고, 늘 회의하고 의심해 보는 사람, 그래서 결국 자기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정재승, <열두 발자국> 중)
세번째, 보이는 부분에 서서 안 보이는 전체를 보려 애써야 한다. 기자는 기자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팩트(fact)를 쫓는다. 팩트는 디테일(detail)을 요구한다. 디테일은 비밀의 방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코끼리 코를 더듬는 것일 수도 있다. 과도한 팩트 지상주의는 자칫 세상이 유·무죄로만 나뉜다고 사고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세상은 회색일 때가 많은데,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라 쓸 때가 많다. ‘야마’ 때문이다. 디테일보다 맥락을 추구하는 게 더 현대적이다. “모든 걸 아는 척 하는 건 기자의 덕목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시청자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사실 전달이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앤더슨 쿠퍼 <CNN> 앵커)
마지막으로, 상식이 우선해야 한다. 기자들은 합리를 추구한다. 기사적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한다. 합리와 상식은 대개 같이 간다. 그런데 가끔 부딪힐 때가 있다. 이때 합리보다 상식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시대에 부합하는 것이라 본다. “인류를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게 만든 것은 개인의 합리적 사고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집단 지성 능력이다.”(유발 하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