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출신 50대 기자, 과학책에 흠뻑 빠져든 이유는?
[인터뷰] 최준석 주간조선 기자
주간조선 편집장을 맡았을 때 그의 나이 쉰 즈음이었다. 하루 24시간 취재로 빠듯한 조선일보를 떠나자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최준석 기자가 가장 먼저 집어든 건 철학책이었다. 인류의 오래된 질문이자 현대 인문학의 ‘큰 질문’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는 철학책을 읽고 또 읽었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붙잡고 여름휴가를 꼬박 나기도 했다. 그러나 철학책은 모호하고, 길고, 어려웠다. 삶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는 다른 책들은 없을까. 추천 도서 목록을 보다 우연찮게 과학책을 보게 됐다. 영국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책으로 그는 기억했다. 이후 8년여간 과학책의 재미에 푹 빠져버린 최 기자의 사연은 이렇게 시작한다.
“지난 수십 년간 자연과학자들이 이룩한 성취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40년 전 학교에 다녔을 때 배우지도 못한 이야기가 책에 무수히 많았어요. 게다가 ‘큰 질문’들은 모두 자연과학자들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철학자들이 먼저 했을지 몰라도 그 답을 찾는 데 있어 훨씬 앞서 가는 건 자연과학자들이었습니다. 과학책이 바로 철학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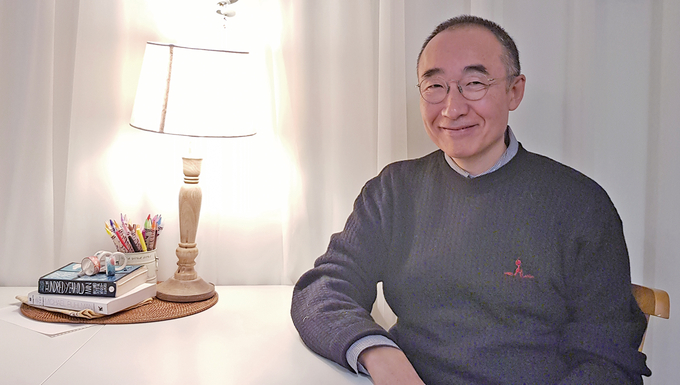
깨달음도 깨달음이었지만 무엇보다 과학책은 재밌었다. 왜 남자의 몸집은 여자보다 더 큰지, 왜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섯 개인지, 피 속의 철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등 과학자들이 들려주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설명은 모두 흥미진진했다. 미국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개미 연구를 통해 쓴 ‘인간 본성에 대하여’ 같은 책들을 그는 전율하며 읽었다. 최 기자는 “과학책이 소설보다 재밌었다”며 “이 재미를 혼자 알기 안타까울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편집장 시절 과학 관련 주제를 커버스토리로 수차례 다루기도 했다. 편집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과학담당기자로 일하며 지난해 내내 대덕연구단지 과학자들을 만났고 올해 역시 한국의 물리학자들을 취재하고 있다. ‘최준석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다. 오로지 과학이 재밌어서 한 일들이다. 최근엔 그간 읽은 과학책 300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나는 과학책으로 세상을 다시 배웠다’를 출간했다. 블로그에 연재했던 독서일기를 새로 엮어 펴낸 책이자 과학책에 입문하려는 독자들을 위한 과학책 큐레이션 가이드북이다.
재미로 읽기 시작했던 과학책은 어느덧 그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으면서 그는 조금이라도 탄소 발자국(사람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소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 최 기자는 “흔히 과학을 지식의 창고, 팩트들의 모임으로만 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급속도로 쌓이는 과학 지식들을 알아야 한다”며 “자연과학은 이과나 공대생들만 배운다는 시선을 바꾸고 싶다. 책이든 유튜브든 여러 방법을 통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과학책 읽기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자들이 과학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떤 한 문제를 집요하게 취재하면서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몇 십, 몇 백억 년 전 우주나 생물의 탄생을 다루는 과학책을 읽게 되면 한층 넓고 깊게 사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기자는 “과학자들이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걸 아주 잘 한다. 자연과학책 대부분이 삶이나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확장할 수 있는 책들”이라며 “기자들이 서점에 가서 과학 코너를 한 번 기웃거려 봤으면 좋겠다. 새롭고 유익한 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