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들을 위하여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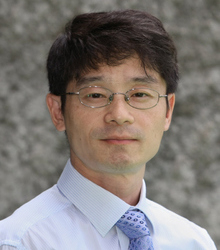 3년 만에 편집국으로 돌아왔다. 국장을 보좌하고, 부장들을 돕는 직책이다. 오전, 오후, 저녁, 밤 8시30분 스탠딩 회의까지, 최소 하루 4번 편집회의가 이어진다. 10여명의 국장단+부장들이 1면 톱을 뭘로 할지, 기사 방향은 괜찮은지, 제목은 어떤지 등을 놓고 씨름하는 건 여전하다.
3년 만에 편집국으로 돌아왔다. 국장을 보좌하고, 부장들을 돕는 직책이다. 오전, 오후, 저녁, 밤 8시30분 스탠딩 회의까지, 최소 하루 4번 편집회의가 이어진다. 10여명의 국장단+부장들이 1면 톱을 뭘로 할지, 기사 방향은 괜찮은지, 제목은 어떤지 등을 놓고 씨름하는 건 여전하다.
일간지 제작 시스템으로 복귀하면서, 맞닥뜨린 첫 느낌은 ‘신문은 수제품’이라는 거다. 오래전 영국 롤스로이스 현지 공장을 취재한 적이 있다. 운동장처럼 넓은 곳에 중·노년 노동자들이 손바느질로, 벌레 물린 자국 없는 스칸디나비아산 소가죽으로, 자동차 내부를 꾸며나가는 모습은 기이했다. 이 시대에도 종이신문을 만든다는 건, 컨베이어벨트 대신 이전처럼 한 땀 한 땀 장인의 숨결을 스미는 처절한 우아함 같은 것인가. 롤스로이스 한 대는 7억원인데, 신문 한 부는 800원이라는 게 우리의 비극이다.
많은 데스크들이 고심할 것이다. ‘달라진 세대와 세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 늘 하던 대로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의 무능과 어설픔을 들키진 않을까’하고. 데스크를 야구 포지션에 비유하면, ‘포수’가 적당하다. 어차피 ‘야구는 투수 놀음’, 영광은 최동원, 선동열 몫이어야 한다. 포수란, 투수들이 믿고 맘껏 공 뿌릴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 혹여 투수의 패스트볼로 공이 빠질 것 같으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투수의 구질과 그날 컨디션을 살피며 잘 리드해줘야 하고, 때론 발빠른 이종범의 도루도 저지해야 한다. 투수가 큰 안타를 맞고 멍할 때에도, 포수는 얼른 마스크를 벗고, 외야수 송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늘 쪼그려 앉아있는 것도 비슷하다.
한 달에 한 번 외부인사들이 지면을 평가하는 ‘열린편집위원회’를 연다. 정치부장에게 물었다. ‘총선 지면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 부장 왈, “매일 뼈와 살을 갈아서…”
싫은 일을 계속할 순 없다. 다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계속할 것이다. (음... 그렇게 믿고 싶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좋음은 더 할 것이다. 농구선수 전주원, 정선민은 같은 팀에서 농구할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움직이는대로 공이 오더라. 농구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때였다”(정선민), “선민이가 온 후로 땀도 안 흘리고 농구했다”(전주원). 그래서 힘들지 않다.
한겨레21 4월20일치에 실린, 이병남 전 LG 인화원장의 말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종교의 수행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선, 소명의식과 인욕(忍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억울함이 생겨도 이를 참아내는 것이 인욕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명의식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샘 워커 월스트리트저널 전 편집장이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인용하며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리더십 칼럼 한 대목이다. “훌륭한 리더들은 위기가 지나가도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해 쉬지 않고, 허세없이 막후에서 일하며, 성공해도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이 정도가 되진 못한다. 반대로 행동하기도 한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당신은 데스크다. 책임질 일과 사람이 있다.
요즘은 기자도 기자를 욕한다. 욕 먹을 일 많고 많다. 하지만, 오늘도 신문 만드는 이 땅 모든 데스크들에게, 이 기자협회보를 보는 찰나만이라도, 작은 위로를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