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란 무엇인가?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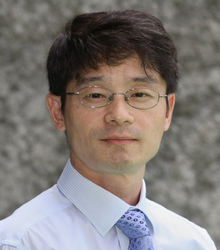 기자가 된 뒤 그런 생각을 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 게 기자와 방송작가’라고.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한다. ‘자신이 한 일에 비해 과도한 욕을 얻어먹는 게 기자’라고.
기자가 된 뒤 그런 생각을 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 게 기자와 방송작가’라고.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한다. ‘자신이 한 일에 비해 과도한 욕을 얻어먹는 게 기자’라고.
과도한 욕은 과도한 영향력 때문이다. 이전 같진 않다 하나, 여전히 언론은 실재하는 권력이다. 과거 기자들은 정보의 유통을 독점했다. 언론을 통해야 공적인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기자보다 더 똑똑한 독자들이 너무 많다. 기자의 위상과 권위가 추락하는 건 당연하다.
이제 기자가 살 길은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그 똑똑한 독자들을 능가할, 만족시킬 역량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첫 걸음은 리포팅(reporting)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은 그 다음이다. 리포팅이란 ‘He said/She said’를 읊조리는 무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사실 위에 어떤 해석이 유의미한가. 사실이 부족할 때, 이를 채우기 위한 ‘사실 대용’으로 해석을 집어넣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해석할 만큼의 사실을 쌓지 못했다면, 해석 자체를 말아야 한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김치는 별반 없고, 고춧가루 양념 범벅 꼴이다. ‘이게 무슨 김치찌개냐’ 항의할 법하다. ‘시장에 김치도, 돼지고기도 없더라’는 말은 가게 주인 향한 아르바이트생 변명은 될지언정, 손님에겐 안 통한다. 억울해도 할 수 없다.
더하여,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도덕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상수로 안아야 한다. 페이스북을 보라.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눈꼽만한 정보라도, 내 편에 유리하기만 하면 확신하는 이들이 차고 넘쳤다. 이는 신앙이다. 기자는 ‘불편한 진실’도 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취재한 게 아무리 귀한들, 이를 객관화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객관화란, ‘내 팩트가 별 것 아니고,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운동가는 확신하고, 기자는 회의해야 한다. ‘무식한데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는 이경규 말 아니어도, 여전히 힘과 영향력을 지닌 기자는 무식해도 안되고, 함부로 신념을 가져서도 안 된다.
또 하나,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세상을 세상에 전할 뿐이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앞서 나가면, 세상은 안 바뀌고 신뢰만 잃는다. 언론이 정파가 아닌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거리두기’에서 가능하다는 게 이론이다. 현실에선 거꾸로 작동한다. 그러니 인내와 설득, 그리고 겸손으로 긴 시간을 채워야 한다. 어쩌면 그날이 오지 않을지라도. 기자협회보 2000호를 맞아 작은 위로라도 전하려 했는데.
CNN 앵커 앤더슨 쿠퍼의 말이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게는 뉴스 리포팅이 그랬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에 힘을 느꼈다. 모든 걸 아는 척 하는 건 기자의 덕목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내 일이 가짜뉴스라고 공격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왔던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계속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홍세화의 말이다. 기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학습을 게을리하여 실력이 부족하면서도 지적 우월감, 윤리적 우월감으로 무장한 ‘민주건달’이 되지 않을 것을 자경문의 하나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