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치의 '아빠·엄마·장인 찬스'
[글로벌 리포트 | 인도네시아] 고찬유 한국일보 자카르타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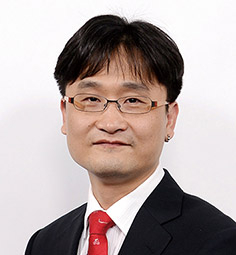 다음달 9일 인도네시아는 지방선거를 치른다. 지역은 270곳, 유권자는 1억600여만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미뤘고 여전히 연기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한국 4·15 총선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달 9일 인도네시아는 지방선거를 치른다. 지역은 270곳, 유권자는 1억600여만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미뤘고 여전히 연기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한국 4·15 총선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 정치인들 이름마저 낯선 인도네시아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긴 이름 두 개를 주목해야 한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맏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기브란)와 사위 무함마드 보비 아리프 나수티온(보비)이다. 둘은 각각 33세, 29세 사업가로 정치 경력이 전무한데도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단박에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 시장 후보에 올랐다. PDI-P는 ‘젊은 인재 발탁’이라고 홍보했다. 심지어 5~9개 당이 공개 지지 의사까지 밝혔다.
기브란이 출마한 중부자바주(州) 수라카르타(솔로)는 아버지인 조코위 대통령이 태어나 사업을 일구고 2005년부터 내리 두 번 시장에 당선돼 입지를 다진 가문의 텃밭이다. 보비가 출사표를 던진 북부수마트라주 메단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예전 무역의 중심지로 수마트라섬의 중심이다. 당선되면 두 사람 모두 중앙 정계 진출의 도약대를 얻게 된다.
현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후보 선정 절차가 먼저 거론됐다. 입당한 지 1년도 안된 두 사람을 위해 PDI-P는 ‘최소 3년 이상 당적을 유지해야 지방선거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는 당규를 무시했다. 반발하는 당내 인사들은 제명됐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장인의 후광을 업고 정치에 입문하는 방식이 옳은지 묻고 있다. 젊은 인재 발탁이라는 원칙이 대통령 가족에게만 적용됐다는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달라진 처신도 실망을 부추기고 있다. 그는 대선에 당선된 2014년부터 공개 석상에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녀들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한사코 부인하다가 2년 전부터 차츰 말을 바꿨다. “금지한 적 없다”(2018년 12월), “한다면 응원하겠다”(2019년 7월)고 하더니 아들과 사위가 자신이 몸담은 당의 후보로 지명되자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결정은 유권자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아들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의혹도 따른다. 한마디로 공약을 깬 셈이다.
인도네시아 국민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정치 왕조의 출현을 우려한다. 아울러 특권이 판치는 비민주적 관행, 균등한 기회 박탈, 정당 제도의 실패, 공익 훼손이라고 꼬집는다. 정치 가문도, 군인 출신도 아닌 첫 서민 대통령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재선에 성공한 조코위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는 모습이 달가울 리 없다. 조코위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아들과 사위의 선거 출마는 대통령 퇴임 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정도다. 조코위 대통령이 초심을 잃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실 가족 정치는 인도네시아 정치사의 유산이다. 1945년 독립 때부터 국민들이 ‘1998년 레포르마시(Reformasi·개혁)’로 수하르토 32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수카르노와 수하르토가 장기 집권했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지만 정치 가문의 영향력은 건재하다.
수카르노의 맏딸 메가와티는 1999년 PDI-P를 창당하고 2001년 국민협의회(MPR)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선엔 실패했으나 PDI-P 총재로서 조코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메가와티의 외동딸 푸안 마하라니는 현재 국회(DPR) 의장이다. 3대째 가족 정치를 이어오는 수카르노 가문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북한 세습 3대와도 대대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1965년 대학살을 통해 수카르노를 권좌에서 밀어낸 수하르토의 정치 자산은 전 사위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계승했다. 대선에서 두 차례나 맞붙은 조코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었으나 지난해 화해한 뒤 국방장관에 발탁됐다. 첫 직선제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 아구스는 아버지가 만든 민주당 총재를 맡고 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장인 찬스’에 길들여진 인도네시아 정치가 조코위 대통령 일가 때문에 도마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지금 공정을 묻는다. 우리는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