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왜 보니?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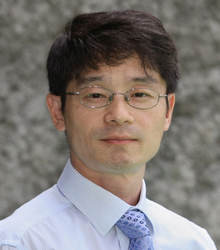 지난 추석 방송인데, 아직도 간간이 회자된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탤런트 김광규씨가 아파트 문을 열고 신문을 집는 장면이다. 다른 출연자들이 “종이신문”에 경악한다. 그 경악에 경악했다. 김광규는 “(노안 때문에) 눈이 너무 아프고”라고 변명한다. 종이신문은 ‘노안’ 온 사람들만 보는 건가.
지난 추석 방송인데, 아직도 간간이 회자된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탤런트 김광규씨가 아파트 문을 열고 신문을 집는 장면이다. 다른 출연자들이 “종이신문”에 경악한다. 그 경악에 경악했다. 김광규는 “(노안 때문에) 눈이 너무 아프고”라고 변명한다. 종이신문은 ‘노안’ 온 사람들만 보는 건가.
신문 칼럼에서 여러 기자들이 언급했다. 강준만 교수는 이 장면을 인용하며 종이신문을 변호했다.(한겨레 11월23일치, “설마 종이신문 보겠어?”) 앞서 한겨레 시민편집인 홍성수 교수도 칼럼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글은 슬프다.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향한 커튼콜 같아서.
이 ‘언론 혐오’, ‘신문 비하’의 시대에도 신문 보는 사람들은 왜 볼까? 예전엔 신문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information) 읽었다. 요즘 편집회의에선 늘 하는 말이 “내일 아침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똑같이 쓰냐”다. 이제 사람들은 신문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insight)를 얻고 싶어한다. 그러니 신문은 관점을 지녀야 하고, 이 관점이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이 관점이 객관성의 외피를 입어야 한다. ‘관점’ 없는 신문은 종이다. ‘공감대’ 없는 신문은 사보다. ‘객관성’ 없는 신문은 동창회보다.
‘제 얼굴에 침’ 좀 뱉는다. 우선, 제대로 된 정파성을 갖자. 신문 정파성은 여론 다양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파성은 ‘가치’에 천착할 때 가치를 인정받는다. 스스로의 가치(이념성·ideologicality)를 배반하고 정치성(politicality)에 복무할 때, 비극은 시작된다. 오늘날 한국 신문들이 이 모양이 된 내부 원인이 여기서부터다. 여기에 한국 언론들의 정파성은 상업적 선정성을 덮었다. 정확성도 의심받는다. 정파성을 유지하되, 사실(fact)을 발판으로 디디고, ‘상식과 합리’의 지붕을 이고 있어야 한다. 희망도 분노도 그 뒤에 있어야 한다. 분노로 뒤덮인 신문을 보는 건 고통스럽고, 바람으로 채워진 신문을 보는 건 안타깝다.
둘째, 오래된 제언 ‘사실과 의견’의 분리다. 요즘은 둘을 합치는 유행도 있다. 그러나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관계자’의 ‘그럴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멘트 따위로 따옴표 큰 제목 뽑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사실화’하고, 객관을 가장하지 말자. 비겁해서 부끄럽다.
마지막, 겸손. 강호의 고수들이 차고 넘친다. 과거처럼 ‘언론사 과거’만 합격하면 갑자기 뭐라도 된 듯한 ‘봄날’은 갔다. 우리(기자)의 자리는 계몽군주가 아니다. 성실한 기록자이자, 사실을 찾는 사람들(fact finder)이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찾은 이 사실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 사안이, 내가 옳다 생각하는 이 의견이,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줏대와 아집을 혼돈해선 안 된다. ‘테스형’ 아니어도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
언론사에 바란다. 퀄리티 페이퍼(Quality paper) 탐하기 전에 퀄리티 리포터(Quality reporter)를 준비해 달라. 기자가 퀄리티하지 않은데, 어떻게 신문이 퀄리티해지나? 교육이 필요하고, 규모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인수·합병(M&A)이 도움될 수도 있다. 한국에선… 넘어가자.
공공(Public)에 바란다. 언론을 시장에만 맡겨둔 결과가 이 모양이다. 언론이 소비자만을 좇으면, 정파성과 선정성은 디폴트 값이다. 이를 거스르는 건 힘들고, 손해나는 일이다. 그러나 때로 필요하다. 그러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언론을 키우는 데는 온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