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변화의 징조?
[언론 다시보기] 나리카와 아야 전 아사히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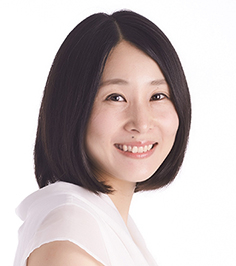
지난해 일본에서는 한국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다음으로 ‘이태원 클라쓰’가 인기를 얻었다. ‘이태원 클라쓰’에선 주인공 박새로이(박서준)가 운영하는 포차 ‘단밤’ 요리사로 트랜스젠더 마현이(이주영)가 등장하는데, 그는 드라마 속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고 주목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됐는지 일본 친구들한테 “한국에서 LGBT에 대한 관심은 어떠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국 언론을 보면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 듯하다. 주로 성소수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일본에서 LGBT라는 말을 언론이 자주 쓰게 된 것은 최근 10년정도다. 그간 LGBT에 대한 편견도 많이 해소됐고, 2015년에 도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에서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가 잇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LGBT라는 말을 쓰면서 이미지가 개선된 면도 있는 듯하다. 소수자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말 대신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치매라는 말은 모멸적 뉘앙스가 있어서 예전에는 감춰야 하는 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인지증’을 쓰기 시작하면서 점점 편견이 없어지고 인지증을 둘러싼 정책도 마련되었다.
나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 LGBT 관련 취재를 여러 번 했다. 시부야구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 인증서를 발급받은 히가시 고유키씨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성소수자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영화나 드라마에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성소수자와 그들의 엄마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을 봤다. 자식들의 커밍아웃에 당황하고 갈등하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성장해가는 엄마들을 보고 감동받았다. 그런데 성소수자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건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느꼈다. 특히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심한 말을 계속 던지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일본에서 주로 재일코리안들을 표적으로 하는 헤이트 스피치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영화나 드라마에 성소수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회가 변하는 징조인 것 같다. 원래 문화예술은 사회보다 조금 앞선 주제를 다루기 마련이고 그 영향력은 크다.
며칠 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백상연극상을 수상한 ‘우리는 농담이 (아니)야’의 구자혜 연출가의 수상소감이었다. 트렌스젠더를 다룬 작품이다. “어떤 사람의 존재는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구자혜 연출가의 수상소감은 ‘이태원 클라쓰’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충격을 받은 마현이에게 새로이가 했던 말과 비슷하다. 새로이는 “네가 너인 것에 다른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없다”고 했고 마현이는 당당하게 요리 경연 결승전에 나섰다.
구자혜 연출가의 수상소감은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예를 들어 한겨레는 ‘백상 수상소감 대상을 뽑는다면…“혐오·차별 방관 부끄러워해야”’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이는 수상소감 중에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차별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을 계기로 언론보도가 늘어나면 정부도 계속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