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새롭지 않은 청년들
[언론 다시보기] 윤서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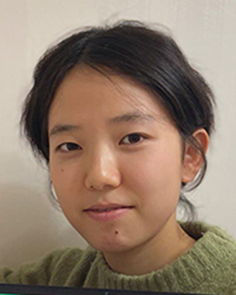
젊은 피의 등장. Z세대가 온다. 90년대생이 온다. 뭐가 이렇게 오기만 하는지. 미디어에선 청년이 자주 나타난다. 개념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역사의식도 부족한 SNS 중독자의 모습과 우리 회사에, 우리 정치에 새바람을 가지고 올 감각적인 일꾼의 모습으로. 최근엔 표심 분석을 위해 그 이름도 알쏭달쏭한 ‘이대남’과 ‘이대녀’로 정치인들의 반짝 관심사가 되었다.
오기만 하는 청년의 얼굴은 쉴 새 없이 바뀐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청년의 얼굴은 어떨까. 통계로 확인해봤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현황’을 분석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체 자살 시도자 5명 가운데 1명이 20대 여성이었다. 전년 대비 33.5%가 늘어난 수치다. 말 그대로 ‘조용한 학살’이다. 죽음의 배경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꾸준히 증가하는 성범죄가 꼽힌다. 조명조차 받지 못한 이름 없는 여성들이 매 순간 세상을 떠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이다.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 소식 역시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지난해 5월 25살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씨는 홀로 파쇄기에 올라가 폐기물을 제거하다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쿠팡 노동자 장덕순씨는 심야 노동 후 과로로 사망했고, 바로 최근 5월13일 평택항에선 이선호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매년 장소만 다른 산업재해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다.
요즘 청년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청년이라 힘든 걸까. 대부분은 스펙 경쟁, 취업 경쟁에 하루 살아가기 바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신을 돌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여성이라 면접에서 떨어지고, 비정규직이라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다 고립된다. 청년들은 여성이어서, 비정규직이어서 힘들다. 그러니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젠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수많은 권리를 수호하는 것과 같다.
5월이면 나는 강남역과 구의역에 포스트잇을 붙이러 간다. 추모하기 위해서다. 2016년 5월17일에는 강남역에서 23살 한 여성이 34살의 연고 없는 남성으로부터 “여자라서” 죽임을 당했다. 2016년 5월28일엔 19살 노동자가 홀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5년 전 그때와 비교해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추모는 일상이 되었고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이 든다.
청년들이 강남역에, 구의역에, 또 공장에, 어느 역사에 있다. 일자리를 잃고 고립되어 있고, 위험한 노동환경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찾아가지 말고, 살아있을 때 조명해 달라. 죽은 사람의 개인사가 궁금한 게 아니다. 그들을 죽게 만든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청년이 올 때만 환영하고 있을 때는 모른 척해서야 되겠는가. 새로운 청년의 얼굴을 찾기보다 이미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얼굴을 발견해 달라. 극심한 우울함에 맞서, 노동환경과 기후 위기에 맞서 피켓을 들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청년의 문제는 그 자리에 있다. 실은 그건 전혀 새롭지가 않다. 낡고 묵은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