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를 보며…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에디터부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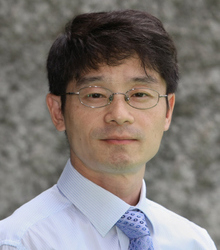
매일 신문을 보면서 주목할 기사에 형광펜을 긋는다. 그런데 지난 5월13일치 4매 정도 짧은 기사에 형광펜 노란색이 가득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첫 여성 편집국장’ 기사(중앙일보 김선미 기자)였다. 눈길이 머문 곳이 많았다.
1. 1월 말부터 새 편집국장을 물색했다 : 5월11일 발표했다. 국장 찾기에 석 달 이상을 들였다. 한국 언론사들은 암묵적으로 정해놓기도 하지만, 때론 1~2주일 만에 후닥닥 해치우는 경우도 많다. 비교됐다.
2. 샐리 버즈비(55) 신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은 직전까지 AP통신 편집국장이었다 : 우리와는 채용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지만, 다른 언론사 현직 국장도 후보로 둔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3. 버즈비는 2017년부터 AP 편집국장이었다 : 이미 4년 간 통신사 편집국장을 했고, 앞으로 수년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으로 일할 것이다. 전임 마틴 배런 국장도 8년을 역임했다. 우린 편집국장을 대개 2년, 길어야 3년, 심지어 1년만에 끝낸다. 한국에선 거의 모든 기자가 연차가 차면 데스크가 된다. 일부 기자만 데스크가 되는 게 미국 언론사 시스템이다. 우리처럼 정치부와 경제부, 문화부를 수시로 넘나들지도 않는다. 오로지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집중한다. 기사, 기자, 데스크 경쟁력에서 후자가 훨씬 나을 수밖에. 한국 언론사들이 지금처럼 기껏해야 한 분야 3~4년 경력으로 데스크를 하고, 현장에는 해당 분야 경력 5년차 이하만 수북한 시스템으로 언제까지 버틸까.
4. (전임) 배런 시절, 워싱턴포스트는 8년 동안 퓰리처상을 10개 타고, 유료 구독자를 크게 늘렸다 : 작품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했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질 높은 기사와 페이지뷰를 양자택일로 인식하거나, 한쪽을 못하는 핑곗거리로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는 배런 아닌, 제프 베조스 공으로 봐야할 것 같다. 베조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하던 당시 거듭된 구조조정으로 기자 수는 580명까지 줄었다. 베조스 인수 이후,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다시 늘어 지금 1000명이 넘는다. 기술팀 인력도 200명이 넘는다. 아마존과 연계한 온갖 마케팅 기법도 동원했다. 2013년 베조스 인수 당시, 2600만명이었던 사이트 방문자 수는 지금 9000만명을 넘었다. 디지털 유료 구독자는 300만명을 넘었다.
한국 언론사들이 앞다퉈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다. 디지털 전환은 신문을 떠나면, 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콘텐츠와 기술 분야 양쪽 투자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전환 이후 디지털 유료 구독자 수가 600만명까지 늘었다는 것에 주목하지만, 디지털 전환 이전 뉴욕타임스의 기자 숫자는 1200명이었고, 지금은 1700명이다.
오랫동안 한국 언론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정파성이라 생각했다. 언론 정파성이 다양성을 제대로 실현도 못한 채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시켜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설 땅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 앞에서 영세성이 점점 더 눈에 들어온다. 영세성 위에 저널리즘을 구축하려면 팩트없는 ‘주장 저널리즘’만 가득 찬다. 정파성에 영세성까지 굴복하면 저널리즘의 미래는 없다. 그럼에도, 저널리즘 부실에 영세성 핑계를 대는 건 구차하다. 우리가 이전엔 ‘흙수저’가 아니었나. 워싱턴포스트 겉치레 흉내내기보다 ‘우리 식’ 길을 찾을 수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