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서로의 국호를 제대로 불러줄 때가 왔다
[이슈 인사이드 | 통일] 맹찬형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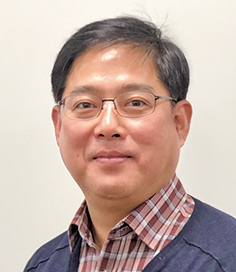
남북은 분단 이래 서로의 이름, 즉 국호(國號)를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다. 남쪽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ROK),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라는 정식국호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상대방을 지칭할 때 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관행에 따라 남쪽에서는 ‘한국-북한’이라 부르고, 북쪽에서는 ‘조선-남조선’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북한을 북한이라 부르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을 남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현재 남북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국-북한, 조선-남조선이라는 호칭에는 상대를 흡수통일 또는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해서 북쪽은 반국가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미수복영토’로 규정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북측의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없다. 다만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적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서문을 개정했는데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문구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다. 또 당원의 의무에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했다. 이를 두고 북이 적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접고 두 개의 국가형태를 지향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 국호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은 외부에서 먼저 시작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 성 김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그의 직책명을 ‘Special Envoy for the DPRK’로 소개했다.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 ‘DPRK’를 사용한 것이다. 전임자인 스티븐 비건의 명함에는 ‘North Korea’라는 철자가 찍혔다.
이 발표가 있은 지 며칠 후 노동신문은 5월30일 자에서 국호에 담긴 긍지와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내 미국의 변화에 호응했다.
공자는 정치를 담당한다면 반드시 정명(正名)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명은 명(名)과 분(分)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바른 이름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명분은 서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의 이름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남측은 북측을 ‘조선’으로, 북측은 남측을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시인 김춘수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