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와 한국언론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신문 에디터부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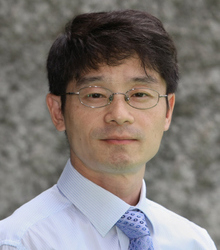
유명한 이야기. ‘펩시 챌린지’ 슬로건을 앞세운 펩시콜라가 1984년 슈퍼마켓 시장점유율에서 코카콜라를 2%포인트 앞섰다. 2차대전 직후 60%가 넘던 코카콜라 시장점유율은 25%까지 급락했다. 이에 코카콜라는 1985년, 단맛을 더한 뉴코크(New Coke)를 출시했다. 앞서 13개 도시 19만여명 소비자조사에서 60%가 기존 코카콜라보다 뉴코크를 택했다. 선풍적 인기를 누릴 줄 알았다. 그런데 출시 이틀 동안 3만1600통의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항의단체까지 생겨 미 전역에서 ‘코카콜라를 돌려달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코카콜라는 79일 만에 ‘코카콜라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기존 코카콜라를 복귀시켰다. 뉴코크는 ‘Coke Ⅱ’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2년 단종됐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국언론에 대입한다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것 같다. 첫째, 클래식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 그나마 갖고 있는 자산을 홀대하거나, 돈 내는 독자들이 한 줌뿐이라 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면 거꾸로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된다. ‘클래식’은 언론사마다 다를 수 있다. ‘클래식’ 변경은 세심하게 해야 한다. 축구대표팀 세대교체처럼. 과정이 거치면 결과도 거칠다.
두번째는 데이터다. 뉴코크 소비자조사는 블라인드 방식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뉴코크 선호도’ 조사다. 실제 하려던 건 ‘뉴코크로 기존 코크 대체’였다. 소비자조사에는 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다. 대부분 결정을 먼저 한 뒤 조사결과를 끼워 맞춘다. 그런데 언론사들은 주요한 변화를 앞두고 소비자조사 자체를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이유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이다. 뉴스 소비자들은 기사 항의는 쏟아내지만 제품으로서의 품질 개선 등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그러니 내부 정책결정자의 ‘바람 또는 의견’이 ‘사실’로 규정되기도 한다. 언론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없으니, 언론사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 많고 중요한 결정도 ‘감’으로 내리곤 한다.
여기에 언론사는 코카콜라보다 하나를 더 고려해야 한다. 언론은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마실까’보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건강(공익)에 더 도움 될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돈만 벌려 한다면, 언론사 하면 안 된다. 만일 ‘뉴코크’가 공익이라면, 언론은 출시해야 한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만 독자 마음 상치 않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다만 끈질기고 정교하게.
그런데 그때 코카콜라는 위기였는데, 지금 한국언론도 위기인가. 1996년 가구당 신문 구독률은 69.3%, 2020년은 6.3%다. 24년 만에 소비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일반 회사는 파산하거나, 몸집을 크게 줄이거나, 아니면 필사적으로 혁신한다. 그런데 개별 신문사들의 매출액은 하향 추세이긴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주요 경제지들은 오히려 그때에 비해 매출액이 2배가량 늘었다.
그러니 굳이 ‘가죽 벗기는’ 고통스러운 혁신 필요가 없다. 코카콜라는 ‘큰 실수’에서 ‘큰 교훈’ 얻었다. 그러나 한국언론들은 ‘큰 실수’를 시도하지 않기에 ‘큰 교훈’ 얻을 기회도 없다.
‘뉴코크’가 단종된 1992년, 펩시콜라도 혁신에 나섰다. 투명색 콜라인 ‘크리스탈 펩시’를 내놓았다. 소비자 외면으로 2년 만에 단종됐다. 콜라 회사는 ‘실수’ 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소비자와 교류하고, 수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