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과 다른 '안전한 공론장'… "우린 문제 해결에 진심입니다"
[미디어 뉴 웨이브]
서로 다른 관점 나누는 플랫폼
얼룩소(alookso)

a look at society. 줄여서 alookso. 우리 말로는 ‘얼룩소’. 이 독특한 작명의 ‘선수’ 등장에 미디어 업계가 술렁였다. 준비 단계부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투자했다는 소문과 시사IN의 간판이었던 천관율 기자가 합류했다는 소식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지난달 30일 베타서비스를 시작하면서는 ‘50자 이상만 써도 매일 100명에게 1만원씩 쏜다’고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등등의 많은 궁금증을 안고 지난 7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얼룩소 사무실에서 정혜승 대표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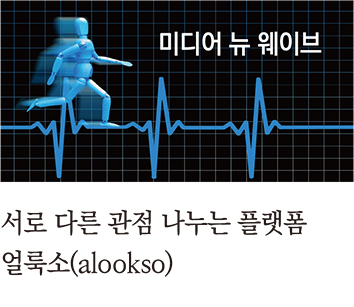
얼룩소는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는 미디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중요한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적어두고 있다. 그걸 구현하는 방식을 고민하다 먼저 지난 3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쏘프라이즈’를 선보였고, 이번엔 마당을 일반 대중에게로 확대한 10주간의 실험 ‘프로젝트 얼룩소’를 시작했다. 얼룩소가 질문 형태로 던진 토픽(주제)에 관해 누구든 50글자 이상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겨서 ‘좋아요’를 받으면 하루 100명에게 1만원을 준다. 이용자인 얼룩커들의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얼룩커 픽’이라면 ‘에디터 픽’도 있다. 얼룩소 에디터들이 고른 좋은 콘텐츠로 하루 최대 5편을 선정하고 메인 화면에 소개한다. 보상도 20만원으로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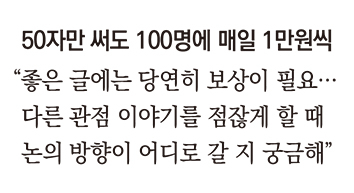
왜 보상시스템인가. 정혜승 대표의 답은 간단했다. “좋은 글에는 보상이 당연히 필요해요.” 보상은 또한 “일종의 마케팅”이자 “사람들을 모으고 ‘얼룩소라는 걸 같이 해봅시다’ 하고 초대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글을 읽고 쓰고 생각을 나눈다는 경험 자체”다. “이쪽저쪽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점잖게 예를 갖춰서 꺼낼 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궁금해요. 기존 포털이나 SNS 댓글은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은 거죠. 건전하고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비판들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보고 싶어요.”
얼룩소가 지향하는 건 ‘안전한 공론장’이다. 그래서 ‘혐오와 차별 없는 대화’ 등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위반 시엔 삭제 등 제재도 한다. 가령 ‘같은 성별끼리 결혼해도 될까요?’ 같은 주제에 대해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라면 험악한 반응이 예상되지만, 얼룩소에선 다르다. 비유하자면 ‘점잖은 아고라’인 셈이다. 이를 가능케 한 건 정 대표의 경력과도 관련이 있다. 정 대표는 기자로 14년, 다음과 카카오에서 9년을 일하고 청와대에선 국민청원을 만들었다. “아고라의 흥망성쇠를 봤다는 게 저에겐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여전히 “의견과 생각이 자유롭게 오가는 놀이터”에 관심이 많다. 토론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리지널 콘텐츠의 강력한 힘 없이 뛰어노는 마당만으로 미디어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 약간 아쉽다고, 그는 말했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지난 14일부터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놓기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서 놓친 질문들을 탐구한 ‘대장동 블루스’가 그것이다. 천관율 기자와 조선일보 출신인 권승준 기자가 썼다. 복잡한 사안을 정리한 이 기사가 던진 건 정답보다는 질문에 가깝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길을 꾸준히 걷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룩소의 믿음이다. 정 대표는 말한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거든요.”
에디터들이 몇 달에 걸쳐 준비해온 오리지널 콘텐츠는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오리지널은 물론 에디터 픽 콘텐츠도 가입과 로그인을 해야만 전문을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 내년 3월 선보일 본 서비스의 형태도 아직은 미정이다. 오리지널 콘텐츠와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전문가, 얼룩커들의 콘텐츠가 기본 축을 이룰 거라는 방향성만 서 있다. 10주간의 실험이 끝나고 보상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뒤에도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게 지금으로선 숙제다. 투자금을 계속 까먹을 순 없는 노릇이니 어느 단계부터는 수익도 내야 한다. 그게 광고든 유료구독이든 답을 찾는 건 이들의 몫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그런 불확실성에 베팅할 만큼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다른 도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에 공감해 전문투자회사가 투자했고, 이름난 기자와 데이터 전문가, 개발자, 기획자 등이 모였고, 이용자들이 찾아왔다. 정 대표는 “생각만 갖고는 안 바뀌니까 실행해보자고 한 거고, 해보니 겁난다”면서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나. 일단 해봐야지”라고 했다. “기승전 포털 탓을 하잖아요. 망가진 이유가 전부 ‘쟤 탓이야’ 하면 편하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냉소하는 건 다 해봤으니 이제 조금 다르게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