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혁신보고서가 실패하는 이유
[언론 다시보기]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 겸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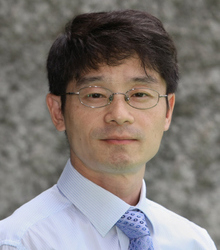
2014년 5월 뉴욕타임스 혁신보고서를 기점으로, 국내 여러 언론사들도 여러 혁신보고서를 냈다. 읽어보니, 보고서대로 하면 그 언론사는 대한민국 최고 언론사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후 잘 됐다는 소식은 별로 못 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외적 환경이 점점 나빠졌기 때문이다. 하락장에선 어떤 펀드매니저도 고수익 내기 힘든 것처럼. 그러나 내부 요인도 적지 않다고 본다. 출발은 대개 ‘보고서 쓴 사람’과 ‘보고서 행할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단기에 성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 임기내, 또는 오너 실망하기 전에, 결과를 보려 하니 때론 가시적(전시) 효과에 급급하다. 그래서 ‘잘한다’ 하더니, 나중 보니 아무 것도 없다. 사람 바뀌면 원점에서 또 보고서를 낸다.
혁신·디지털 보고서 내기 전에 10년 뒤, 20년 뒤 어떤 언론사가 되길 원하는지 먼저 푯대를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10년 뒤 거기 닿으려면 지금, 5년 뒤 뭘 해야 하는지 구획을 그어야 한다. 히딩크 5대0 시절처럼, 한동안 ‘고통 터널’도 견뎌야 한다. 월드컵 본선보다 평가전 이기려 애쓰니, 수단이 목적화 된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묻고, ‘하라니까 해’라고 답한다. 이러고도 성공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기다. 혁신보고서 아닌 ‘2030(년) 보고서’, ‘2050 보고서’를 먼저 써야 하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도 길러야 한다. 기자를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은 ‘잦은 인사’다. 언론이 정보를 독점하던 시절엔 언론사 입사만 하면, 졸지에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정보가 공개·공유되는 요즘 더 이상 그런 우월적 지위를 누리긴 힘들다. 그러니 이젠 과거보다 축적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 기자의 부서 선택 시간을 단축하고, 섭렵 부서는 두세 곳으로 축소해야 한다. 언론사 들어오기 전에 ‘나는 뭘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때 할 고민을 대학 와서 하고, 대학 때 할 고민을 회사 와서 한다.
기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대부분 기자는 ‘부장’이 되면 안 된다. 지금은 열에 아홉이 ‘부장’ 되니, 안 되면 섭섭하다. 앞으론 열에 한둘만 되어야 한다. 보직 아닌 해당 분야 전문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문성 쌓지 못하고 여러 보직 떠돌았던 이가 할 말은 아니나) 2000년 전후 여러 언론사들이 전문기자제를 도입했다. 지금 대부분 접었다. 후배들 보기에 ‘전문기자’보다 ‘부장, 국장’이 나아 보였던 것도 한 원인이다. 기자의 전문성을 우대하지 않으면서 기자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염치없는 짓이다.
그리고 편집·보도국장은 오래 했으면 좋겠다. 뉴욕타임스 딘 베케이 편집국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직을 수행한다. 최근 물러난 마틴 배런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은 9년간 수행했다. 가디언의 앨런 러스브리저는 20년간 편집국장이었다. 한국 언론들의 국장 임기는 점점 짧아진다. 인사권자 바뀌면, 공영방송에선 정권 바뀌면, 바뀐다. ‘부족한 혁신’이나 ‘조직내 불만’을 무마하려고 바꾼다. 이렇게 해선 매니저의 전문성도 기대하기 힘들다.
언론사의 조직구조는 몰개성적 공공기관 또는 군대와 비슷하나, 실제론 개별 퍼포먼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연예매니지먼트 또는 프로축구단에 가까울 수 있다. 회사나 구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보다, BTS와 블랙핑크 또는 메시와 호날두가 있냐 없냐가 미래를 좌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