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파인더 너머] (122) "아따, 쌔빠닥 까지 얼얼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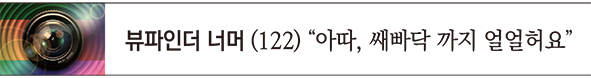
'뷰파인더 너머'는 사진기자 조수정(뉴시스), 최주연(한국일보), 구윤성(뉴스1), 정운철(매일신문), 김애리(광주매일)가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만난 사람과 세상을 담은 에세이 코너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말투와 억양, 발음 속도까지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발음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감정까지 표현하는 게 언어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표준어만 고집해 왔다. 국가가 못을 박아버린 틀에 갇힌 언어만을 쓰도록 강제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표준어규정 제1장_총칙의 1항)’. 서울 인구를 뺀 국민은 표준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극단적으로 옛날에 쓰던 사투리는 그럼 없어져야 할 언어들인가? 전국 8도마다 특색있는 언어와 특징적인 억양들이 코미디 프로그램 한 코너 속 웃음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투리는 웃음 소재가 아닌 그 지역의 특색과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전달 수단이다. 지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한 PD는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를 표준어로 자막을 만들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
표준어 규정처럼 표준어를 써야 교양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인 나는 지역의 언어마저도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언론은 왜 표준어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정작 지역언론은 지역색과 지역의 감수성이 담긴 사투리를 활용하고 보존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 의문과 고민이 머리를 맴도는 시간에 동물들의 여름 나기 취재를 갔다.
갈색꼬리감기원숭이가 얼린 과일을 먹으며 더위를 쫓고 있는 장면을 취재하며 상상해 본다. ‘너도 광주에서 꽤 살았으니 사투리를 하겠네? 지금 심정이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혓바닥까지 너무 시원합니다”라고 표준어로 대답할까? 아니면 “아따, 쌔빠닥까지 얼얼허요’라고 사투리로 대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