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파인더 너머] (171) 인터뷰 사진의 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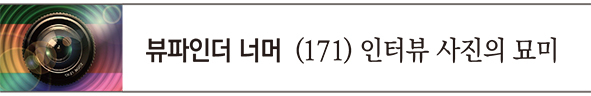
‘뷰파인더 너머’는 사진기자 장진영(중앙일보), 오세림(전북일보), 홍윤기(서울신문), 김진홍(대구일보), 김범준(한국경제), 박미소(시사IN)가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만난 사람과 세상을 담은 에세이 코너입니다.
카메라를 잡는 시간이 더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다. 다양한 순간들을 꼽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단연 벅찬 순간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인터뷰이로 만났을 때다. 지난 주말 <러브레터> 이와이 슌지 감독과 <냉정과 열정 사이> 요시마타 료 음악감독 인터뷰에 다녀왔다. 두 감독은 스타일이 정반대다. 요시마타 료 감독은 카메라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며 취재에 즐겁게 임했다. 반면 이와이 슌지 감독은 표정도 무뚝뚝했고 자세도 뻣뻣했다. 감독들의 성격은 자신의 음악과 영화를 닮았다.
피사체가 까다로운 인터뷰이일 땐 종종 불편한 상황이 생기곤 한다. 인터뷰 사진의 경우 100장 정도를 찍어야 겨우 1~2장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는데, 불과 몇 장을 찍은 뒤에 ‘그만하자’고 말하는 인터뷰이들이 그 예다. 의전 인력 십여 명이 따라붙는 바람에 인터뷰이와 소통이 안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사진이 매력적인 이유는 인터뷰이의 흔들리는 눈동자, 멋쩍은 웃음, 거친 피부들이 눈에 들어올 때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서다. 막연하게 동경했던, 그저 단상만 지니고 있었던 인물들의 생동감 넘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 백명의 인터뷰이를 만났다. 오전엔 판소리 대가를 만나 음악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엔 범죄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찢어지는 아픔을 듣기도 한다. 한두 시간 남짓한 시간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을 들었다. 오늘도 수백 장의 사진 중에 가장 인터뷰이를 잘 담아낸 사진 1~2장을 추렸다. 신문엔 단 한 장만 들어가는 시스템에 아쉬움도 남지만, 그 한 장에 모든 걸 담기 위해 매일 분투하는 묘미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