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는 언론에 묻는다
[언론다시보기]신경민 전 MBC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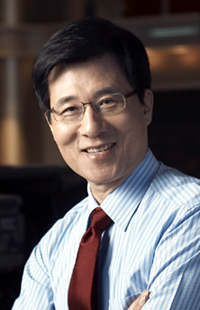 |
||
| ▲ 신경민 전 MBC 논설위원 | ||
도가니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낸 사학의 주역들과 상하 권력들 곧 정치인,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 경찰관, 검판사와 변호사, 종교인, 교직원 등 힘 있는 집단의 결합을 파헤쳤다. 권력들은 백일하에 드러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별 일 아닌 짓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장애인 교육이란 근사한 슬로건, 취직 미끼와 상납구조의 공생, 전관예우가 등장하고 기소 독점제, 편의적 작량감경, 친고죄, 미성년 보호와 친권제 등 법률 논리가 동원된다.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 종교연 등 인연과 돈이 춤춘다. 결국 완전히 성공했다.
‘다행스럽게’ 영화와 소설은 현실과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언론을 깊게 다루지 않았다. 기득권의 짜임 속에서 신음하던 약자들을 위해 서울 언론이 통쾌하게 보도하는 장면을 담았다. 그러나 지역 언론이 아니라 서울 언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시시콜콜 파헤치고 다른 서울 언론들이 애써 외면하는 이유를 따진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학교 내부와 지역 사회가 참혹한 현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방관하고 입을 다물었던 배경을 살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긴 침묵과 방관의 이유가 언론다운 언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면 할 말을 찾기 어렵다. 작가와 감독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언론은 만약 언론이 초기에 진지하게 접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현실의 언론이 실제로 분노의 도가니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더 참담한 현실은 법과 공권력이 개입한 이후이다. 서울의 일부 언론이 비춘 빛은 잠깐일 뿐 가해자 권력이 중범죄를 뭉개버린 채 원위치한 이유에 대해 만약 언론이 절절이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물어야 한다. 권력들의 종횡무진 전횡이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언론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복기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언론 전문지가 당시 언론보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질문에 대해 실망스러운 답변이 나왔다. 현실 언론의 보도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고 심지어 기 막혀 항의하는 장애인에게 집회 관련법 위반을 들이밀면서 재단과 교권의 추락을 걱정하는 보도까지 나타났다. 언론이 내외부 권력에 하부구조로 편입한 것이다. 그 중에는 소수자를 깔보거나 밝은 뉴스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 그럴 듯한 뉴스 해설을 하는 인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도가니 얘기에서 장애인 강간에 분노하고 면죄부를 주는 제도와 논리 그리고 인연에 분노하는데 그친다면 문제의 언저리에 머문다고 볼 수 있다. 도가니가 말하는 바는 소수자인 장애인이 겪은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와 권력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이 적은 것이다. 곧 권력들에 대한 고발장이다. 이런 고발을 이념의 문제나 빨갱이의 논리로 대치하거나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 황동혁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한다. “이건 비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견고하고 높은 기득권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약자가 돼야 했던 사람들과 묻혀버린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
도가니에서 장애인을 괴롭히는 교장과 행정실장은 기득권의 고리에서 중간급에 속하고 거기에 기생하는 하부 권력, 상생상존하는 각종 권력이 등장한다. 크고 작은 권력이 만들어 내는 탁한 구조는 오염된 현실로 변한다. 정상인이자 보통 사람인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권력과 맞닥뜨렸을 때 오염된 현실은 벌써 온존하고 있다. 소수자에게 적용됐던 어처구니없는 제도와 논리 그리고 인연은 바로 또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옥죄어 온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언론은 권력과 현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소수자와 보통사람들이 접하는 일상적인 사건사고와 불합리한 일들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남의 불행에 흥분하면서 요란을 떠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작은 권력이 조성하는 불합리에 침묵하면 큰 권력은 반드시 큰 비리를 만들어 낸다는 진실에 주목해야 한다. 도가니에서 나타났던 권력의 전횡에 언론과 사회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권력과 비호 권력을 제대로 응징하고 논리를 이겨낼 수 있었다면, 용기 있게 고발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했더라면 장담컨대 권력과 악당들이 설치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었을 것이다.
도가니를 보면서 언론이 다행스러워 한다면 이미 자격을 잃었다. 언론 시늉이라도 내려면 권력과 비호동조 세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 황 감독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적어도 뜨겁게 울컥”이라도 해야 한다. 동시에 강유정 평론가의 지적대로 “영화는 사이렌과 같아 사이렌이 울리면 멈추지만 사이렌이 멈추면 곧 제 걸음을 가”버려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론의 의제를 집요하게 설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