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보다 무서운 디플레가 온다
[스페셜리스트 | 금융]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부장·신문방송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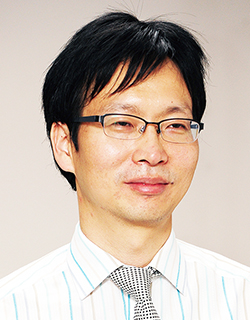 낯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세계 경제에 공포의 얼굴로 다가온 건 1930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때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쯤으로 치부됐다.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보상금을 내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던 독일에서 벌어진 통제 불능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목격한 이들은 디플레를 오히려 ‘축복’이라며 찬양하기도 했다.
낯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세계 경제에 공포의 얼굴로 다가온 건 1930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때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쯤으로 치부됐다.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보상금을 내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던 독일에서 벌어진 통제 불능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목격한 이들은 디플레를 오히려 ‘축복’이라며 찬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디플레는 전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대공황의 전조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디플레라는 망령을 불러내는 주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29년 금본위제의 굴레에 묶인 뉴욕 연방은행은 달러 투기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천장을 모른 채 벌겋게 취해 오른 주식시장이 일순간 검은 잿더미로 변한 그해 10월28일 ‘블랙 먼데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었다.
이처럼 대공황의 배경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오판과 그에 따른 정책 실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후 미 주식시장이 대공황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2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뉴딜 정책’으로 대변되는 루스벨트 정부의 대공황 처방은 정통적인 디플레이션(긴축) 정책을 인플레(팽창) 정책으로 치환하는 과정이었다.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인플레이션은 불공정하고 디플레이션은 부적절하다”면서 “둘 가운데 디플레이션이 더 나쁘다”고 했다. 연금생활자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인플레에 비해 디플레는 실업 등 파괴적 재앙을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로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디플레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일본이 장기 디플레에 빠진 것은 자산시장 버블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총수요 위축과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경기 상황을 오판해 긴축재정으로 선회했다. 이는 ‘경기 후퇴→부동산 가격 폭락→금융기관 채권 부실화→대출 회수→실물부문 위기→금융과 실물 경제 동시 불황’으로 이어진 복합불황의 단초가 됐다.
한국경제에도 디플레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위축된 가운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다. 올 들어 줄곧 0%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급기야 사상 첫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다. 이런 저물가 상황은 농·축·수산물,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에서 상당 부분 기인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 하락의 요인으로 ‘수요 위축’을 지목했다.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총수요를 구성하는 대부분 영역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실상 디플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총수요를 직·간접적으로 누르는 소위 디플레 정책들을 재고해야 한다.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성장력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활력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경제는 심리에 좌우되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