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 자동화 기술 적용? 인공 보철물 수술 같죠"
[인터뷰] 연합 AI팀 '김태균·권영전 기자, 박주현 차장'
2016년 한국 언론계에 ‘로봇 저널리즘’ 바람이 분 지 약 4년이 흘렀다. 그동안 기계는 증시,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사람처럼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증명했지만 한편으론 편집국 기사 생산 과정과는 완전히 분리돼 기자들에게는 존재감이 없다시피 했다. 컸던 기대만큼 관심도 빠르게 식던 2018년 무렵, 연합뉴스에 AI팀이 발족했다. 이전에도 사커봇, 올림픽봇 등 다양한 기사 자동화 실험을 했던 연합뉴스였지만 엔씨소프트와 MOU를 맺으면서 AI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기자인 김태균 차장과 권영전 기자, 엔지니어인 박주현 차장으로 이뤄진 AI팀이 꾸려졌다.
이들의 첫 번째 과제는 내부에서 환영받을 자동화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었다. 자동화를 낯설거나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AI팀은 가장 먼저 편집국 기자 210명을 대상으로 ‘어떤 자동화와 AI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미리 검토한 30여 후보 서비스를 설문지로 제시하고 이 중 도입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최대 10개까지 뽑게 했다. 김태균 차장은 “사람이 해야 될 일과 기계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논의 자체가 없었기에 수요조사부터 한 것”이라며 “인공 보철물을 넣으면 사람 몸이 더 편해질지, 거부 반응은 없을지 짚어보는 일이었다. 덕분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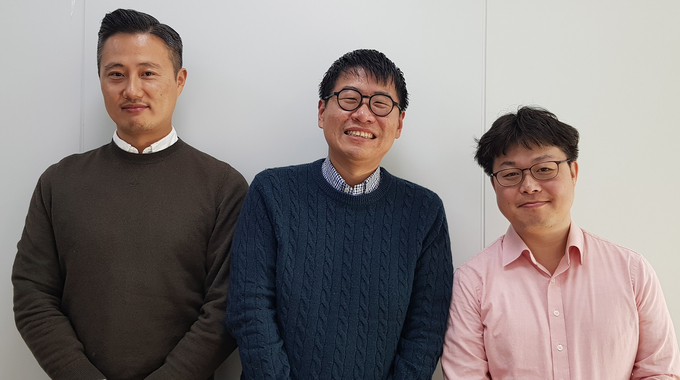
팀 내에서도 투표를 통해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실제 자동화로 구현이 가능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상위권 몇 개를 뽑아 자동화 기술 목록을 만들었다. 지진 속보, 로또 당첨, 기업 실적 기사 등이 그렇게 목록에 올라 자동화가 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자동화된 로또 기사는 주말 밤 경제부의 누군가 최소 30분~1시간은 당직 일을 해야 했던 구조를 타파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박주현 차장은 “고침기사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잘못 나가거나 내용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 기사를 고쳐 쓰면 고객사에게 재빨리 고침기사를 보내야 했는데 이 작업이 사실 기자들에겐 귀찮은 일 중 하나였다”며 “반면 고객사 편집 담당에겐 중요한 정보 아닌가.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고 했다.
다만 이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팀원들이 겪는 노고는 상상초월이었다. 데이터의 천국인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없거나, 있다 해도 어렵게 구해야 할뿐더러 그렇게 구한 데이터마저도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권영전 기자는 “데이터를 정교하게 만들어 공개하는 건 보도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 등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자주 얘기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루려면 구조화된 데이터가 기본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데이터라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존 업무 체계에 이를 부작용 없이 얹는 것도 쉽지 않았다. 기사 생성 단계에서 기자의 감수를 거쳐야 하는지, 사후 오류 대응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등 판단할 문제가 줄줄이 딸려 나왔다. 자동화 기사가 꼭 줄글 형태여야 할까 같은 고민도 수없이 많았다. 최근 AI팀은 이런 고민을 담은 고군분투 실무 체험기, <AI시대의 저널리즘>을 펴냈다. 팀원들은 “자동화와 AI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부닥쳤던 주요 난제를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책을 쓰게 됐다”며 “어디서 참고할 선례도 거의 없던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을 풀어갔던 기록이다. 자동화와 AI 기술을 언론 현장에 적용하는 현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