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닐곱 큰딸이 물어본 꽃이름… 그때부터였죠"
[인터뷰] '꽃으로 소설을 읽는 미중년' 김민철 조선일보 선임기자
“아빠, 이게 무슨 꽃이야?” 2003년 봄, 예닐곱 살의 큰딸은 호기심이 많았다. 아파트 공터에 피어나는 꽃들을 가리키며 자주 이름을 묻곤 했다. 무슨 꽃인지 알 길이 없던 김민철 조선일보 기자는 매번 답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큰딸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자 아빠 체통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어느 날 야생화도감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다. 꽃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밌었다. 이름을 몰랐던 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게 계기였다. 이후 20여년간 그는 야생화에 푹 빠져 전국을 누비며 꽃을 보고 관련 이야기를 칼럼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개하는 ‘꽃기자’로 성장했다. 두 딸에게 풀꽃과 나무 이름을 알려주는 아빠가 된 건 당연하다.
김 기자는 “우리나라 꽃이 4500가지 정도 된다. 보통 500~600 종류를 알면 중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름 아는 걸로만 치면 1000개 정도는 돼서 고수와 중수의 사이쯤인 것 같다”며 “관심을 가진 지가 20년이라 통달을 해야 하는데 자꾸 꽃 이름을 잊어버린다. 특히 원예종 이름은 외래어로 돼 있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다시 보곤 하는 게 일상”이라고 말했다.

꽃의 세계에서 이름을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흔한 개나리조차 암수를 구분하는 문제로 학계에서 논문이 나올 정도로 복잡하다. 재야에 고수도 많다. 학창 시절부터 수많은 소설을 읽었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그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야생화와 문학을 접목하기 시작했다. 소설의 주요 소재나 상징으로 등장하는 꽃을 찾아 그 의미를 해석했다. 2013년 <문학 속에 핀 꽃들>을 시작으로 <문학이 사랑한 꽃들>, <서울 화양연화> 등 문학과 꽃을 주제로 연달아 책을 냈다. 지난해 말엔 아예 박완서 소설만을 따로 뽑아 <꽃으로 박완서를 읽다>를 펴냈다.
김 기자는 “꽃이 나오는 박완서 소설이 하도 많아 그동안 책을 쓰면서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일 때가 많았다. 그러다 문득 꽃이 나오는 박완서 소설만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해를 꼬박 박완서 소설에 묻혀 살았던 것 같다. 꼭 다루고 싶은 작품인데 꽃이 안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에 대여섯 번씩 읽다가 겨우 상징적인 의미를 찾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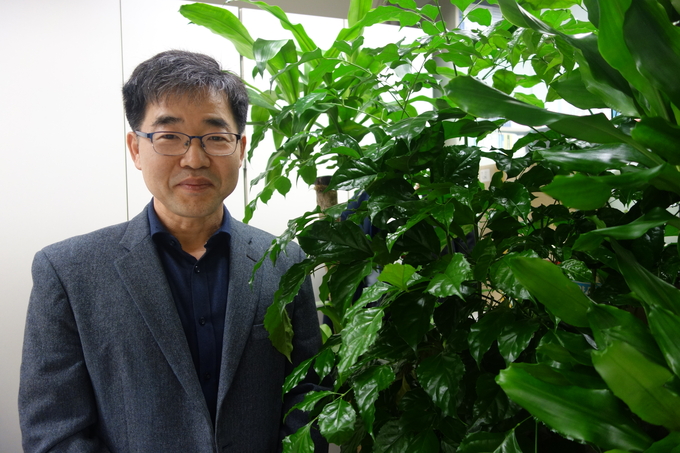 이를테면 <카메라와 워커>가 그렇다. 소설의 배경인 오대산 월정사 입구의 옥수수 밭은 작가가 단지 풍경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만 사용했을 수 있지만 김 기자는 어디서나 쉽게 잘 적응해 뿌리내리는 옥수수의 특성을 알고 작가가 작품에 의도적으로 배치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거저나 마찬가지>의 때죽나무나 <저문 날의 삽화 5>에 나온 은방울꽃도 소설에서 아주 일부분 다뤄졌지만 그는 작가의 생애와 시대상을 통해 의미를 찾아냈다. 김 기자는 “박완서 소설만을 모아 원 없이 꽃 이야기를 쓰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며 “특히 ‘아껴가며 읽고 싶다’는 독자 반응을 접했을 땐 큰 보람을 느꼈다. 내년이 박완서 선생 10주기인데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박완서의 작품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카메라와 워커>가 그렇다. 소설의 배경인 오대산 월정사 입구의 옥수수 밭은 작가가 단지 풍경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만 사용했을 수 있지만 김 기자는 어디서나 쉽게 잘 적응해 뿌리내리는 옥수수의 특성을 알고 작가가 작품에 의도적으로 배치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거저나 마찬가지>의 때죽나무나 <저문 날의 삽화 5>에 나온 은방울꽃도 소설에서 아주 일부분 다뤄졌지만 그는 작가의 생애와 시대상을 통해 의미를 찾아냈다. 김 기자는 “박완서 소설만을 모아 원 없이 꽃 이야기를 쓰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며 “특히 ‘아껴가며 읽고 싶다’는 독자 반응을 접했을 땐 큰 보람을 느꼈다. 내년이 박완서 선생 10주기인데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박완서의 작품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해 두 권의 책을 낸 탓에 그는 당분간 내실을 쌓을 계획이다. 다만 몇 년 후엔 세계문학, 동화, 영화 등에 나온 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오랜 꿈인 소설을 쓸 생각도 있다. 김 기자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긴 하지만 시도는 해볼 생각”이라며 “당연히 제 소설엔 꽃이 들어갈 것 같다. 다만 많이 사용하기보단 적재적소에 딱 한 번, 그러니까 박완서의 <그리움을 위하여>에 나온 복사꽃처럼 보석같이 반짝이는 표현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권의 책을 낸 탓에 그는 당분간 내실을 쌓을 계획이다. 다만 몇 년 후엔 세계문학, 동화, 영화 등에 나온 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오랜 꿈인 소설을 쓸 생각도 있다. 김 기자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긴 하지만 시도는 해볼 생각”이라며 “당연히 제 소설엔 꽃이 들어갈 것 같다. 다만 많이 사용하기보단 적재적소에 딱 한 번, 그러니까 박완서의 <그리움을 위하여>에 나온 복사꽃처럼 보석같이 반짝이는 표현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