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난곡' 70여일 현장취재로 '빈곤 대물림' 추적
[저널리즘 타임머신] (71) 기자협회보 2001년 4월 21일
한국 탐사보도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중앙일보의 2001년 4월9일자 <현장리포트-‘서울 최대 달동네 신림동 난곡’ 시리즈> 기사의 리드는 이렇게 시작한다.
“산꼭대기의 파란색 공동화장실.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평균 경사 35도의 골목길, 주로 소주·라면만 팔리는 동네 가게, 옛 삼성전자 로고가 남아 있는 1970년대식 거리 간판, 아직도 두 집에 한 집꼴로 연탄을 쓰는 곳. 여기는 2001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101 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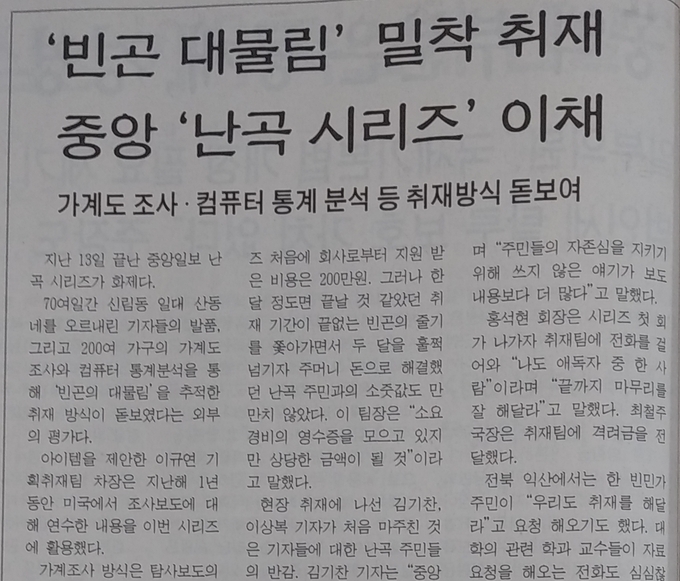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변했지만 당시 난곡은 2000여 가구의 저소득층이 사는 서울에서 가장 큰 달동네였다. 중앙일보 취재팀(이규연 김기찬 이상복 박종근)은 2001년 4월9일자를 시작으로 5차례 기획기사로 난곡에서 벌어지는 가난 대물림의 실상을 집중 조명했다. 이 기사는 이듬해 1월 한국기자상(기획보도 부문)을 받았다.
기자협회보는 2001년 4월21일자 보도(‘빈곤 대물림’ 밀착 취재/중앙 ‘난곡 시리즈’ 이채)를 통해 난곡 시리즈 뒷이야기를 실었다. 기자협회보가 주목한 것은 당시 한국 언론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취재방식이었다.
취재팀은 주민 200명을 면접 설문조사하고, 컴퓨터 통계분석 등 심층조사기법을 동원했다. 설문지의 50개 질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과 신림복지관의 자문을 받았다. 취합된 설문지는 컴퓨터 보도(CAR) 방식을 활용해 정부 통계 등 여러 변수와 함께 종합 분석했다.
취재팀은 1월 말부터 난곡지역에 들어가 현장취재를 벌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감이 예상보다 심했다. 주민들은 ‘취재해서 무엇 하느냐’ ‘남의 사생활을 왜 자꾸 묻느냐’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70여일간 난곡에 머무르며 주민들과 안면을 텄다. 산동네를 오르내리는 기자들의 발품에 주민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다. 나중엔 밤늦도록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됐다. 그렇게 취재팀은 난곡지역 가난의 원인과 실태, 주민들의 의식 구조 등을 생생하게 담아 빈곤의 세습화 실태를 파헤쳤다.

취재팀은 사전 취재를 하면서 어느 교수가 던진 한마디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88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빈민 정책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더니 빈민층 문제로 기자들이 찾아온 것은 꼭 10년 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난곡’ 같은 민생의 현장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다. 언론이 엉뚱한 곳을 쳐다보며 주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