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저널리즘'의 서글픈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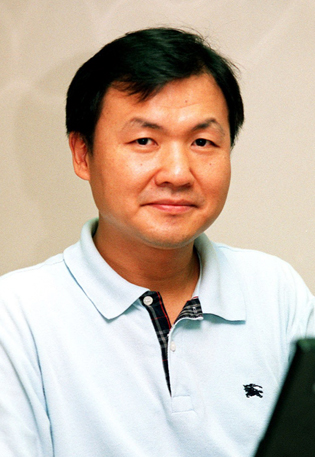 |
||
| ▲ 서병기 기자 | ||
편집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자사의 매체에 톱기사로 올린 것이 포털 뉴스로 가면 단신급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단신으로 쓴 기사가 포털로 가면 ‘대문’에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연예기자들은 포털 뉴스의 ‘대문’에 올리기 위해 자신의 기사를 꽃단장해야 하는 자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종이 매체들은 자체의 영향력으로 어느 정도 버티지만 신생 인터넷 매체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매체 파워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절이 가고 매체의 유통이 중요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포털사이트 회사를 농수산물유통공사, 포털뉴스를 가락동농수산물 시장 쯤으로 비유하자면 연예기자인 나는 사과상인 셈이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일년내내 사과를 재배하는 나는 재배농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긴 공급과잉 현상 앞에 가격폭락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가락동 시장에 사과를 내놓아도 진열해주지 않으면 판매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내가 재배한 사과의 질은 소비자가 결정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상당 부분 결정해버린다.
언제부턴가 연예기사는 리얼타임으로 생산된다. 송승헌이 신체검사를 받던 날 무려 1백20여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송승헌 현역’(1보) ‘송승헌 고혈압’(2보) ‘한재석 공익근무’(3보) 기사가 나가고 종합기사를 다시 쓰는 기사분할 방식이 유행이다. 재빨리 써봐야 3시간 짜리 시한부 ‘톱’이다. 토씨만 약간 다른 기사가 무려 20개씩 올라온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보도방식은 국력낭비다.
빨리 써야 판매가 되니 허위기사 양산의 위험을 안고 있다. 영화홍보사에서 특정 영화의 개봉에 앞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그 영화의 주연배우와 작업하고 싶다는 보도자료를 돌려도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하고 쓰면 속도에서 뒤진다.
매체와 포털 간에 기사 꼭지수로 계약된다는 점도 포탈뉴스 체제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심층 해설, 비평기사나 완성도 높은 화제 기사보다는 짧고 제목이 강한 ‘사실 나열형’ 기사 위주로 공급될 수밖에 없다. 양적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editor나 rewriter, 표절기사까지 자주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공룡이 된 포털에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매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괜히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수많은 연예매체가 똑같은 스타일로 기사를 생산하는 무한 경쟁을 벌이지 말고 ‘특화’를 이루는 것은 해결책의 시작이다. 속보를 위주로 하는 매체와 화제기사를 위주로 하는 매체 등으로 말이다.
포털업체도 이런 지향점을 갖고 동참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연예저널리즘을 발전시킬 수 있다. 편집의 전문성을 강화해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포털업체의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