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디지털 전환으로 얻은 가장 큰 수확… '전방위 협업·공조 체제'
중앙일보는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을까. 최근 몇 년 간 언론계에서 가장 궁금해 해 온 질문 중 하나다. 일부 콘텐츠에 대한 호평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뉴스유통 부문 선전은 일면에 불과하다. 중앙일보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각 부서·구성원 간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협업 체계 구축이다. 협력이 디지털에 적합한 콘텐츠 발굴로 이어지고 구성원의 디지털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과정이 되는 협력의 선순환 구조야말로 중앙이 이룬 성과다.
중앙 조직은 디지털국과 비(非)디지털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전제로 한 구조다. 편집인 아래 ‘편집국’과 ‘디지털국’, ‘제작국’이 놓인 편제는 인테이크(Intake, 취재), 커맨드(Command, 총괄), 아웃풋(Output, 편집)으로 업무를 분화했다. 편집국에선 하루 250~300여개 온라인 기사를 출고한다. 미리 완성된 지면 템플릿에 맞춰 A형(10매), B형(7매), C형(5매)으로 분량을 맞춘다. 제작국은 이중 일부를 재가공해 지면에 싣는 방식이다.

중앙 디지털 부문 관계자는 “편집국 개별 부서에서 사진, 영상을 넣어 온라인 기사를 출고한다. 속보 전담 조직인 EYE24팀도 편집국 산하”라며 “디지털부서에서 온라인 기사를 직접 생산하는 게 대부분인데 우린 일부를 제외하면 직접 제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디지털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디지털국 산하 ‘디지털 컨버전스팀’의 ‘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으로 이뤄진 팀은 중앙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단기전략 및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중앙일보 사이트 및 모바일 외부유통 전반(기획, 개발, 디자인), JAM(CMS)관리, 벌크전송, 앱 내 ‘스타기자’를 비롯한 브랜드 전반 관리 등 업무는 타 부서·기자 등과 공조를 필요로 한다. 중앙 한 관계자는 “컨버전스팀 카운터파트는 편집국 모든 부서다. 예전엔 디지털에디터 정도랑 얘기했고 부서에선 별 관심이 없었다. 지금은 부서 데스크, 기자와 직접 소통한다”고 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회사 내에서 어떤 아이템을 독자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키우겠다는 제안이 있으면 컨버전스팀과 논의한다. 자사 사이트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싹수가 괜찮으면” 디지털국 산하 뉴스서비스실 프로젝트팀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받는다. 결론이 나면 기자와 개발자, 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 팀으로 독립해 나간다. 일을 주제로 한 솔루션 콘텐츠 서비스 ‘폴인’팀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기사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안 받거나 요구하고 실현을 위한 제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컨버전스팀 인원은 3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편집국에 처음 자리 잡았을 땐 13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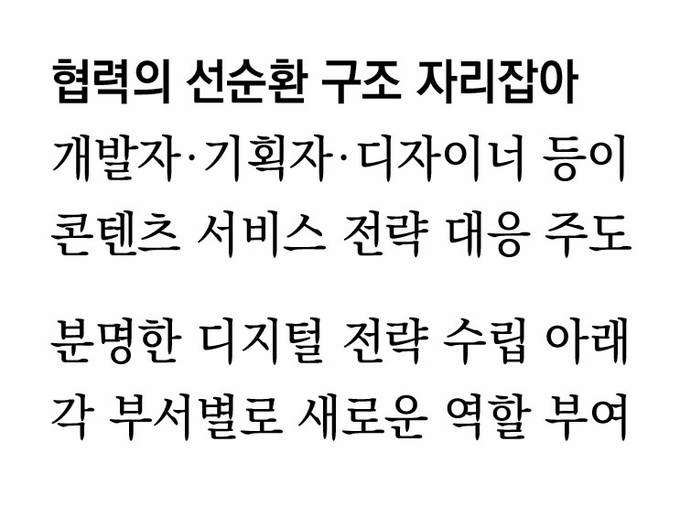
컨버전스팀을 비롯한 디지털국 산하 미디어데이터팀, 디지털콘텐트랩, 에코팀 등 4개 팀과 뉴스서비스실 내 2개 팀(썰리, 폴인) 역시 각 팀 내외는 물론 여러 직군의 협력에 기반한다. 미디어데이터팀은 콘텐츠 소비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일상적으로 취재부서에 제공한다. 디지털콘텐트랩은 기자는 물론 데이터분석가까지 포함된 새 콘텐츠 연구소다. 편집국 기자들과 협력해 디지털 특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다. 호평을 받은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살림’ 등이 대표적이다. 에코팀은 SNS를 전문 운용하며 바이럴을 담당한다. 이 역시 편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다.
그 외 독립적인 콘텐츠와 브랜드를 내걸고 제작은 물론 유통까지 책임지는 뉴스서비스실 내 팀들(인턴 포함 각 10~15명)도 여러 직군의 협력으로 운용된다. 현재 중앙 디지털국 전체 인원규모는 100여명으로 기자 수는 10명이 안 된다.
 중앙 내부에선 최근 수 년 새 구성원들의 디지털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평이 많다. 단적으로 기사당 첨부되는 평균 사진 수가 당시 1개에 못 미쳤다면 현재는 3개 이상이다. 이젠 디지털 부문과 경영관련부서의 정기 미팅 자리도 마련돼 상호 간 이해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중앙 내부에선 최근 수 년 새 구성원들의 디지털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평이 많다. 단적으로 기사당 첨부되는 평균 사진 수가 당시 1개에 못 미쳤다면 현재는 3개 이상이다. 이젠 디지털 부문과 경영관련부서의 정기 미팅 자리도 마련돼 상호 간 이해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모든 언론사가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한 디지털 전략수립 아래 부서 간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에 특화된 뉴스 제작시스템(CMS), 자체 데이터 분석툴(JA) 등 인프라 구축이란 바탕에 수차례 조직개편을 거치고도 현재 수준의 디지털마인드가 조직 내 공유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김영훈 중앙일보 디지털국 국장은 “결국은 같이 일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한다. 서로 전문성을 존중하고 기획 단계부터 협업이 돼야 완성도 높은 콘텐츠, 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서 “큰 프로세스 틀이 서 있고 발전 중이라 보지만 우리도 과정 속이다. 현업에서 실제 부딪치고 실행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