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툴고 투박하지만… 기초체력 다지는 '신문사 영상'
각 사들 영상 강화체제 돌입

영상 콘텐츠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신문사들이 분주하다. 방송 매체 틈바구니에서 분투하던 일부를 넘어 상당수 주요 신문사가 동영상 강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전략과 실행단계에선 차이가 있지만 영상 강화라는 방향성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공통이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1월 영상 브랜드 ‘오리지너’를 론칭, 12일 오후까지 총 15개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 한 상태다. 취재 기자와 DB콘텐츠부 기자, PD 등 3인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진짜’(혹은 ‘기원’)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방하고 있다. 인터뷰부터 ‘대치동 사교육’, ‘IMF 금 모으기 운동의 진실’까지 폭넓게 이슈를 커버한다. 레거시 미디어로서 어떤 콘텐츠를 다룰지, 텍스트가 무기인 신문사 영상은 어때야 할 지 고민이 담겼다.
이 같은 정공법의 영상 브랜드는 현재 5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한국 영상 전략의 일부로 자리한다. ‘프란’이 10~30대 여성을, ‘오리지너’는 20~40대 남성을 타깃으로 “저널리즘을 어떻게 더 잘 할지” 고민 결과를 내놓는다. 타 채널은 목표가 다르다. 베트남 구독자 대상 한류 대중문화 채널 ‘K-TREND’, 아이돌 중심 연예 채널 ‘덕질하는 기자’, 한국일보E&B의 미스코리아 자원을 활용한 뷰티·일상 채널 ‘블링팩토리’는 기존 언론사 콘텐츠 포트폴리오의 확장을 꾀한다.
강희경 한국일보 영상팀장은 “한국일보 단일 브랜드로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봤다. 채널별로 차별(variation)을 둔 것”이라며 “(정통 저널리즘 콘텐츠가) 구심력이라면 타 채널은 원심력이다. 기존 신문사가 해보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주요 신문사들은 영상 강화를 위한 본격 실행에 앞서 조직개편, 인·물적 투자, 계획수립에 골몰하는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연말 디지털 부문에서 소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던 뉴콘텐츠팀 산하에 기존 영상팀이 편입되며 12명의 조직으로 확대됐다. 이지선 경향신문 뉴콘텐츠팀장은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 그동안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지속 생산했는데 영상팀을 합쳐 영상 고민도 하고 시너지를 내보자는 거다. 어떤 콘텐츠를 할지부터 플랫폼별 채널전략, 인력충원 등까지 한 달 내 답을 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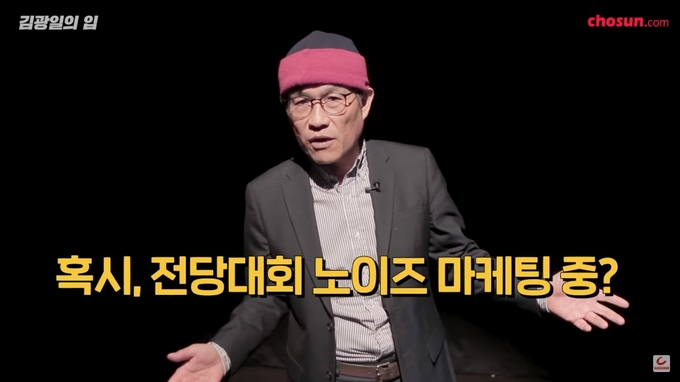
‘라이브 방송’을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거나 실시해 오던 신문사들은 분주한 준비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브 영상을 선보여 온 조선일보는 평일 오후 3~5시 편성해 온 생방송 일정을 약 2주 동안 취소키로 했다. 디지털을 담당하는 조선비즈 편집국장 인사와 스튜디오 완공에 따른 장비 이전 등이 이유다. 다만 ‘김광일의 입’ 등의 성공적 론칭으로 흐름을 탄 만큼 영상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7만9000명이던 조선일보 채널 구독은 현재 17만7000명이 넘는다. 신효섭 조선비즈 대표이사 전무 겸 편집국장은 “디지털뉴스본부장 시절 직접 출연도 했고 영상 자체에 거부감도 없다. 취임한지 일주일 밖에 안돼서 리뷰를 해봐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영상에 적극 대응하는 기존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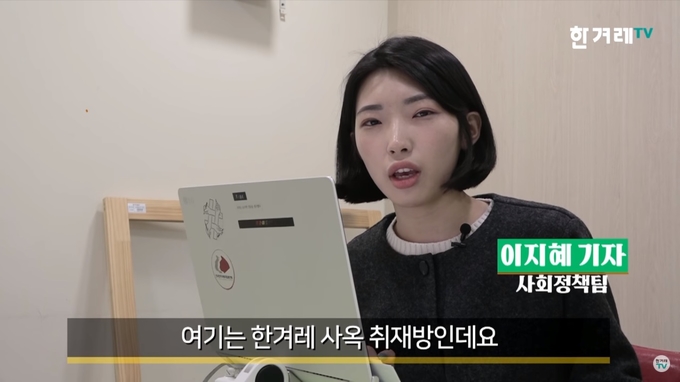
오는 5월을 목표로 데일리 라이브 방송을 추진해 온 한겨레신문은 방송 인력채용과 스튜디오 공사를 목전에 뒀다. 조만간 경력기자 채용과 함께 카메라, 컴퓨터 그래픽, 기술감독, PD 등 총 10명 내외의 영상 인력을 뽑는다. 이달 말부터 스튜디오 공사도 시작한다. 박종찬 한겨레 영상에디터는 “영상 제작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영상공장이 갖춰지면 회사 의견을 모아 파일럿을 만들고 차츰 콘텐츠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이트 중심 뉴스라이브와 셀럽이 진행하는 시사토크쇼 두 축을 생각하고 있다. 디지털영상기획팀에서 재미있는 시도들을 보여줘 자극이 됐는데 젊은 기자들이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건 어떨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사와 함께 그룹사를 이룬 신문사와 닷컴은 콘텐츠 자체 고민과 별도로 그룹이 보유한 영상 자산의 활용에도 애를 쓰고 있다. 동아닷컴이나 매경닷컴 사이트 등에서 볼 수 있는 ‘보다스튜디오(Voda Studio)’, ‘엠플레이(M Play)’ 같은 플랫폼이 사례다. 자체 구축한 플랫폼에서 스마트미디어렙(SMR)이 위탁받아 제공하는 지상파와 종편, CJ ENM 등 주요 방송사 클립 영상이 재생되면 프리롤 광고 수익 중 일부가 언론사로 돌아간다. 자사 클립이 타 플랫폼에서 소비돼도 수익이 되는 만큼 ‘윈-윈’의 구조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포털에 치이는 언론사들의 현실은 드러난다.
그룹 언론사의 한 관계자는 “특정 클립이 시청됐을 때 콘텐츠 생산자가 55, SMR이 35, 유통 플랫폼이 10을 가져간다. 도움은 되지만 실상은 네이버TV와 카카오TV에서 60%이상 유통되고 나머지를 9개 플랫폼이 나눠 갖는 식이라 큰 수익은 안 난다”며 “어떻게 봐도 언론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