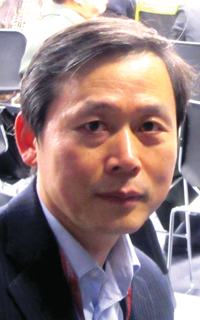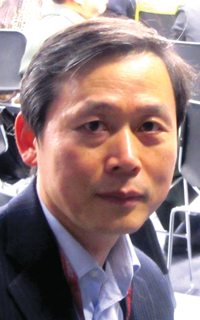[글로벌 리포트] 전체기사
-
2012.12.19 15:57:21
-
2012.12.12 14:50:49
-
2012.11.21 16:11:44
-
2012.11.14 15:03:05
-
2012.10.31 15:46:02
-
2012.10.24 15:03:11
-
2012.10.17 14:34:51
-
2012.10.10 15:38:17